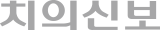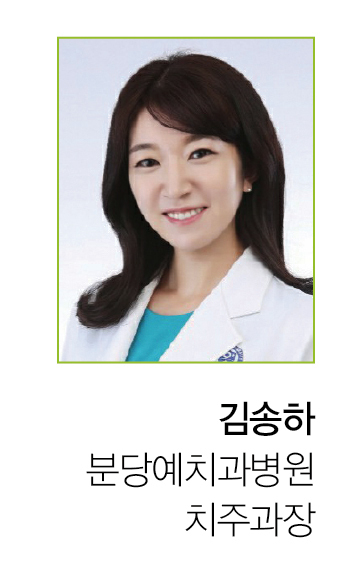
여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만, 여행의 순간이 즐겁고 가볍기만 한 건 아니기에,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예전에 다녀온 미국이 너무 좋았음에도 시간과 스팟과 동선을 생각하면 막상 쉽게 다시 가지 못한 채 10년이 지나왔듯이…
그러던 중 <Yellow Stone> 국립공원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다. 스쳐 지나던 인터넷 블로그에서 노랗고 빨간 테두리를 가진 사파이어 빛 온천을 보았을 때 저긴 어딜까 했던 기억은 꽤 오랜 시간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본 사람은 커녕, 루트조차 단순하지 않아 한 켠에 접어두기를 2년.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은 마음속의 기갈증이 되어 목이 마르니, 어떻게든 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동행을 구하고, 차를 빌려 주섬주섬 떠나게 되어 시작된 여행.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시작은 어려웠으되 시작된 것은 전광석화와 같은 법이었다.
직항은 당연히 없고 그나마 가까운 보즈먼 공항으로 가려면 시애틀을 경유해야 했다. 이 와중에 동행으로 만나기로 한 샌프란시스코의 친구는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놓쳐 비싼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만나게 되었으니, 보즈먼에서도 또 차로 2시간을 이동해야하는 <Yellow Stone>은 역시 쉽지 않은 길임을 첫날부터 체감하였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이지만, 미국에서 살다온 사람들조차 쉬이 가지 않는, 그래서 더욱 궁금했던 그곳은 도착하자마자 차 반경 10m 이내로 다가오는 사슴들에 탄성을 지르며 시작되었다.
10월 초였는데, 당연히 영화에서 보았던 황금빛 들판에 스러지는 석양 사이로 무소의 뿔들이 사라지는 장면을 기대하였건만, 눈발이 흩날리던 북부 <Canyon>은 밤을 지나고 나자 빙판길, 눈밭이 되었다. 예상 못한 겨울 날씨에 떨면서 마주한 <Yellow Stone>의 <Grand Canyon>. 지반이 융기되어 산맥을 이루었으되 저 거대한 폭포수는 어디서 오는 건지, 천연의 차가운 바람은 숨을 트이게 하고 canyon의 광경은 정신을 트이게 하는 듯했다.

다음날 마주한 <Grand Prismatic Spring>, <Yellow Stone>의 시그니처인 이 곳을 방문하고서야 여행의 정점을 찍은 기분. 여길 오게 했고, 기대하게 했던 오색 찬연한 온천, 유황이 박테리아를 함유해 온도별로 변한 색이 띠를 이루니 자연의 색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었다. 전망대에서 spring을 내려다보며 이곳의 목적을 이루었음에 하이파이브를 외쳤을 때, 고생을 해서라도 올 만한 가치가 있었음에 기뻐했다.
<Yellow Stone>을 지나 <Grand circle>을 들른 뒤 도착한 샌프란시스코(SF)는 이번 미국 여행의 두 번째 기대가 있었던 곳. SF에서 LA까지 이르는 서부 해안도로는 꼬박 하루, 적절하게는 1박 2일이 걸리는 길이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곳. LA까지는 너무 멀고 SF 1번 국도를 따라 몬터레이로 이르는 길을 당일로 다녀오기로 하고 오픈카를 빌렸으니, 바닷바람의 소금기를 느낄 새도 없이, 눈은 햇살이 부서지는지 파도가 부서지는지 모를 수평선에 머물고, 내 영혼은 바람과 함께 나부끼는 듯하였다.
<17mile>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길, 이어 해질녘이 되어서야 도착한 <Bixby Bridge>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문득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 나이의 감정에 빙의된 인생무상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 없이 달려볼 수 있는 길, 가도 가도 끝나지 않는 이 길이, 지금이 아니면 없을 것 같은 열정과 앞으로 가야할 인생의 반면교사 같았달까. 이윽고 내달려 돌아온 샌프란시스코에서 밤 11시40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났다.
다음날 JFK 공항 도착시간은 오전 7시 30분. 우버를 타고 다리를 건너 멀리 보이는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때는 <Begin Again>의 키이라 나이틀리와 애덤 리바인이 꿈꾸듯 뉴욕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다. 뉴욕이란 그런 곳, 여러 반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꿈꾸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상. 그들이 이루어 놓은 마천루는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냥 가을의 <Central park> 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였으니, 아직 오픈되지 않은 방에 들어가지 못해 <Central park> 앞 호텔에 짐만 던져놓고 베이글과 아메리카노 사들고 걷다 걷다, 10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Jacqueline Kennedy Onassis Reservoir>에 이르러서야 한 모금 마실 수 있었다. 너를 보는 나는 변한 것 같지만, 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가 보고 싶었다고, reservoir와 조우를 하곤 잔디밭에 쓰러져 베이글을 문 채 잠이 들었으니, 뉴욕에 온 목적은 이제 이루었다.

없던 일정을 넣은 뉴욕에서의 1박 2일, 이틀째도 아침부터 <Central park>에서 조깅과 자전거로 시작했는데, 우중충했던 하늘마저 나의 이틀밖에 안 되는 체류를 어여삐 여겼는지 맑게 개었다. <Yellow stone>에서 만난 친구가 꼭 권유해주었던 뉴욕에서의 스냅촬영은 아직 가을이 완연하지는 않았지만, 햇살, 바람, 공원 그 자체로 아름다운 <Central park>의 10월을 충분히 느끼게 했다. 베데스다 분수에서 upper west에 이르는 산책로를 걸으며 마주한 모습들은 10월의 날씨와 조화된 자연, 거리의 첼리스트, 물방울 장수들, 사진 찍는 연인들, 그리고 그 안의 나. 사진은 그 곳에서의 나를 담았지만, 나는 그 날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 담았으리라.
뜻하지 않게 서에서 동으로 횡단한 12일에 이르는 미국 여행은 길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담은 듯 했다. 그 와중에 일정보다 내 발걸음의 가벼움과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은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장소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과 틀 이외의 곳에서 나다움을 만나고, 나아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좀 덜 보고 한가하면 어떠한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의 발전이 있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많지만, 새로운 장소에 대한 신비감보다는 여전히 내게 감동과 감흥을 주는 곳을 찾고 싶다. 꼭 먼 곳과 낯선 사람이 있는 곳만은 아니겠지, 내일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인생, 그 자체가 여행이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