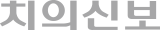가을 추(秋)는 벼 화(禾)자와 불 화(火)자가 결합된 단어이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볕에 말리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라는 말이다. ‘말의 우주’에서 우석영 선생은 그것을 뒤집어 곡식이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사태라고 푼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 곡식 뿐인가? 사과도 감도 붉게 무르익고 있다. 익숙한 방문객처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이 찾아온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주여, 해시계들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오곡 무르익은 들판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주여, 마지막 남은 열매들까지 익게 하시고,/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열매들이 영글도록 재촉하시어/단맛 중의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가을 추(秋)는 벼 화(禾)자와 불 화(火)자가 결합된 단어이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볕에 말리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라는 말이다. ‘말의 우주’에서 우석영 선생은 그것을 뒤집어 곡식이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사태라고 푼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 곡식 뿐인가? 사과도 감도 붉게 무르익고 있다. 익숙한 방문객처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이 찾아온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주여, 해시계들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오곡 무르익은 들판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주여, 마지막 남은 열매들까지 익게 하시고,/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열매들이 영글도록 재촉하시어/단맛 중의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교우 한분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사무실 창틀에 걸어놓았다. 일을 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 창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붉은 감 열매는 수줍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나 또한 흐뭇한 미소로 응대했다. 채 두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딱딱하던 감이 홍시가 되었다. 무르익은 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는데 곁님은 질크러지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채근한다. 그제서야 할 수 없이 그 붉은 열매를 입에 넣는다. 숙성된 시간이 거기에 있었다.
감 열매를 맛보며 이재무 시인의 ‘땡감’을 떠올린다. “여름 땡볕/옳게 이기는 놈일수록/떫다/떫은 놈일수록/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떫은 놈일수록/벌레에 강하다/비바람 이길 수 있다/덜 떫은 놈일수록/홍시로 가지 못한다” 시인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여름 땡감처럼 단단한 놈이 없다고 탄식한다. 기존질서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일까? 순치된 젊음처럼 슬픈 것이 또 있을까? 땡감처럼 ‘떫은’ 세월이 없으면 홍시의 시간을 맞을 수 없다. 물론 저절로 홍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무르익음은 시간의 온축이다. 무르익은 것은 아름답다. 연주도 운동도 마찬가지다. 기량이 무르익은 이들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은 보고 있는 이의 마음을 긴장시키기보다는 이완시킨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분초 단위로 분절된 세상은 무르익기까지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찾는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즉시 폐기처분에 들어간다. 생산과 폐기 사이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악마적인 경향이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런 세계에 익숙하다. 설익은 말과 몸짓이 난무한다. 거친 말, 편가르는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선명한 입장으로 포장되어 함부로 배달된다. 날카로운 말에 베이고, 뭉특한 말에 멍들고, 위협적인 표정과 몸짓에 짓눌려 우리 가슴은 시퍼런 멍자국 투성이다.
가을은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라고 말한다. 질주하는 시간의 고삐를 붙잡고 잠시 낙엽의 궤적에 눈길을 주어도 좋고, 대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혹은 흘러가는 강물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좋고, 밤하늘의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아도 좋겠다. 그럴 수 없다면 따뜻하고 맑은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고 그 향을 마음을 다해 맡아보자. 시를 읽어도 좋겠다. 시 구절 하나를 붙들고 오래오래 생각에 잠겨보자.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온 세상이 신비임을 아는 사람은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스러지곤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시는 어떤가? “유자차를 마신다.//지난 여름 어느 날/아무도 몰래/어느 유자나무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물에 풀어 마신다.”(이현주)
기가 막히지 않은가.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여름날 아무도 몰래 그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풀어 마신다니. 소박하지만 가멸진 그 누림이 부럽기만 하다. 아니,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시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짐짓 발걸음을 늦출 수만 있어도 삶은 풍성해진다. 가을에 취해 시를 징검다리 삼아 예까지 왔으니 또 다른 시 하나로 글을 매조지한다.
“가을의 기도는/잎 떨어진 나무 아래서/자신을 비우는 일이다.//맑게 쓸어논 마당에/한 잎씩/새로 낙엽을 앉히듯/그렇게 비어가는 자신을/지켜보는 일이다.//서릿빛 가지에/외로운 마음 비추어 보고/비추어 보고//홀로 떠날 준비를 하며/두 손으로/물을 마시는 일이다.”(이성선, <가을의 기도는>)
김기석 목사/청파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