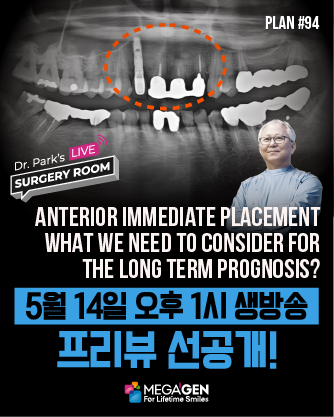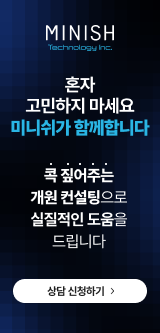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끝낸 후, 환자로부터 ‘턱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혹은 ‘턱에서 소리가 난다.’ 심지어 ‘멀쩡했던 입이 치과진료 후 안 벌어진다.’ 라는 불평에 당황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난발치나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후, 혹은 까다로운 신경치료나 염증이 심한 잇몸치료를 시행하고 스스로 만족감과 보람에 뿌듯해 하고 있을 즈음, 환자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는커녕 책임지라는 볼멘소리를 들으면, 환자의 증상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과연 이러한 턱관절 증상이 정말로 내가 시행한 치과치료 후 발생하였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심지어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 준 환자에 대해 서운함까지 들 것이다.
사실 건강한 턱관절을 가진 환자라면, 정상적인 치과치료 후 이와 같은 측두하악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거니와, 설령 치료 후 턱관절에 불편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절히 안정을 취하면 큰 문제없이 증상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행해진 치과치료 중 측두하악장애가 발생하였다면 환자는 이미 치료 전부터 어느 정도 불안정한 턱관절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록 환자가 치과치료를 시행받기 이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고, 턱 운동이 불안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중 주의를 요하지 않거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 설명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치과의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치과의사라면 치료 전 구강 검사 단계에서 반드시 턱에서 소리가 나는지, 개·폐구 운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이갈이와 이악물기 같이 턱관절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악습관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환자에게 설명함으로 인해 술자 자신도 치료 시 더욱 주의를 요할 수 있고, 치료 후 환자의 턱관절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한 환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치과치료 중 발생하는 측두하악장애는 대부분 관절음, 통증, 개구제한과 같은 측두하악장애의 3대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중 술자나 환자 모두에게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증상은 바로 개구제한일 것이다. 치과치료 후 개구제한이 발생하면 우선 그 원인을 감별해야 한다. 환자가 관절의 염증이나 저작근의 장애로 인한 통증 때문에 개구를 못하는 것인지, 악관절내장증과 같은 관절원판의 구조적 변위 때문에 개구제한이 나타난 것인지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 감별이 가능한데, 환자가 스스로 벌릴 수 있는 능동적 개구량이 25∼30mm 정도로 개구제한이 발생한 경우, 술자의 손가락 끝에 살짝 힘을 주어 환자의 상,하악 전치부를 밀면서 수동적으로 개구를 유도한다(그림 1).
만약 수동적 개구량이 능동적 개구량과 별 차이가 없이 술자의 손에 딱딱한 저항감(hard-end feel)이 느껴지고, 개구 및 전방운동 시 이환된 관절 쪽으로 하악의 편향(deflection)이 관찰되며(그림 2), 측방운동 시 이환된 관절의 동측으로 움직이는 측방운동(ipsilateral eccentric movement)은 정상이지만 반대측으로 움직이는 측방운동(contralateral eccentric movement)이 제한된다면, 이는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관절원판의 정복(reduction)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절원판을 정복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 스스로 전위를 정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입을 약간 벌린 채로 하악을 전위된 반대쪽으로 가능한 최대로 멀리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편심 위치에서 입을 최대로 벌리게 한다(그림 3-A, 3-B). 이러한 시도를 수차례 반복하여도 관절원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