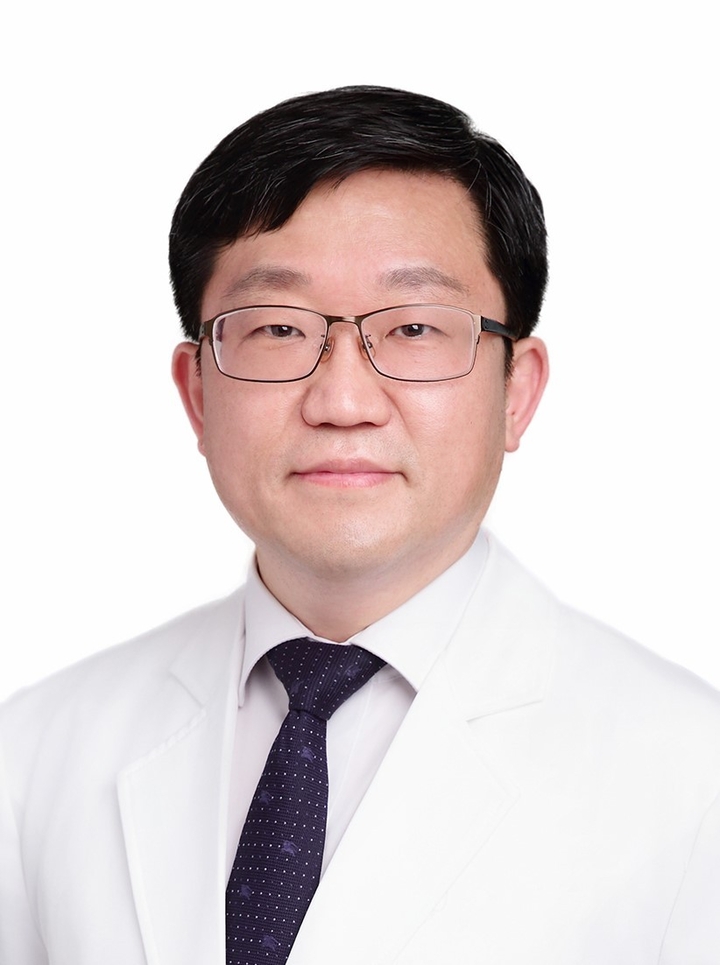
작년 연말에 반가운 e-mail을 받았다. 메일을 보고, 예전 미국 미시간 앤아버에서 지낸 2년간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다.
미시간에서 연구년을 시작한 2007년, 지역 센터(community center)의 소개로 자원봉사로 영어 대화 파트너(conversation partner)를 해 줄 수 있다는 학생과 연결이 되었다. 이후 미시간 공대 2학년 학생 John과 만나 영어회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John과 나는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매주 한 번씩 캠퍼스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덕분에 미국 사회의 경제, 정치, 종교 현황, 미국 대학생의 일상, 가치관 등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폭설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휴교하던 어느 날, John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었다. 눈 때문에 버스가 잘 오지 않아서 아침에 한 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north campus의 공대에서 실험하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한 시간을 걸어서 치대가 위치한 central campus에 도착한 것이었다.
3학년이 되자 John은 의대에 가고 싶다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John은 주말에 미시간대학 어린이병원(Children’s hospital), 암 센터, 앰뷸런스 환자 수송 등의 봉사활동을 하느라 주말에 정말 바빠 보였다. 그 당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0 대 1, 치대 경쟁률은 대략 20 대 1 정도였고, 의대 들어가려면 당연히 학부 점수,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MCAT, 우리나라 의전원/치전원 시험과 비슷)가 높아야 하며, 특히 많은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시카고 Loyola 의대는 400시간, Rush 의대는 1,400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요구하였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8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야만 400시간을 채울 수 있고, 1,400시간이라면 매주 주말과 방학 전체를 봉사활동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자식을 의대에 보낸 이민 간 친구의 말에 의하면, 미국 의대에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봉사활동 경력도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학업까지 탁월한 학생”을 원한다는 것이다.
John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 대학병원 안과 교수였고 집안도 넉넉했으나, John은 자가용 없이 다녔다. 미시간 대학에 유학 온 한국인 학부생, 대학원생 대부분이 차를 몰고 다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아버지가 학회 연자로 갈 때, 고등학생이던 John을 가끔씩 데리고 갔다고 한다. 아버지가 호텔방에서 강연 준비만 하고 학회장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관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학회장 뒷구석에 앉아서 아버지 발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기억만 난다고, 왜 날 거기에 데리고 갔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다.
내가 미시간에서 귀국할 무렵, John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라도 꼭 해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대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써 주었다. 지난 2년간 내가 봐왔던 John의 굳건한 책임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된다면 나와 내 가족을 기꺼이 맡겨도 되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내가 귀국한 그 다음 해, John이 Texas 의대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작년 성탄절 즈음, John이 컴퓨터 정리를 하다가 내 메일 계정을 다시 발견하고 안부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지금은 워싱턴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로 통증 조절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혼해서 애를 낳아 잘 지낸다고 하였다. 혹시 마누라가 그때 그 여자 친구 맞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것은 직접 만나면 물어보기로 하였다.
고등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햇병아리 의료인이 되고 수련을 거쳐 자신감 넘치는 전문의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가끔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학업 성적이나 지적 능력이 환자를 보는 능력과 비례하지는 않으며, 환자를 대하는 핵심 능력은 바로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미국 치의학 교육 협회(ADEA)에서 전공의 지원 과정을 관할하는 PASS(Postdoctoral Application Support Service)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때 추천서를 첨부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직접 추천서를 upload 하면서 전공의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올리게 되어있다. 평가는 ① 평균 이하, ② 평균, ③ 평균 이상, ④ 월등함(상위 5%), ⑤ 진정으로 탁월함(상위 1%), 또는 ⑥ 잘 알 수 없음, 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1) 지식과 창조성, 2) 소통 능력, 3) 팀워크, 4) 회복탄력성, 5) 기획과 조직력, 6) 윤리의식과 진실성, 이렇게 6가지 항목이다. 즉,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굳이 말하자면 1) 번 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자신이 똑똑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하여 경직된 사고를 가지며, 또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도 약하여 팀플레이에 둔하다. 즉, 내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 덕택에 자신의 위치를 획득하였다고 확신하면, 남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또는 기득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3) 번 “팀워크” 항목에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거나 비판을 줄 수 있는가?”, “단체로 일해야 하는 조건에서 잘 해내는가?” 하는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인턴/레지던트 선발 시험 배점을 보면, 필기시험(50점), 서류(학교성적/인턴근무성적 30점), 면접(20점)으로 되어 있으며, 남을 이해하는 능력, 도전과 후퇴를 잘 극복하는 능력,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이러한 자질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많은 시간의 봉사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봉사활동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길러지지 않을 비인지적 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과정이며,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전공의를 선발하는 과정에 이러한 비인지적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John의 아버지가 재미없는 안과 학회에 굳이 고등학생 아들을 왜 데려갔을까? 이제 내 나이가 당시 John의 아버지와 비슷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고단한 삶의 일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래도 하고 싶은지 언젠가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답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생이나 전공의 평가 기준(지식과 창조성, 소통 능력, 팀워크, 회복탄력성, 기획과 조직력, 윤리의식과 진실성)은 교수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떻게 보면 평생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덕목과도 같다.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물음은 학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물음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