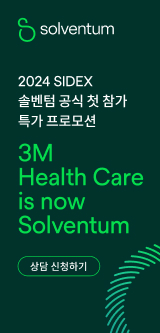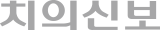나의 정신 세계는 두 마리의 새가 있다. 하나는 붕이라는 새이고, 하나는 가마우지라는 새이다.
붕이라는 새는 장자 내편 첫편에 나오는 상상의 새다. 북명에 사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새로 화하면 붕이라는 새가 되는데, 붕의 등은 몇 천 리나 되고, 성이 나서 날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고 물은 삼천 리를 치고 회오리바람을 두드리면 구만 리를 오른다고 되어 있는 새다.
장자의 정신 세계는 삼천 리니 구만 리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작은 정신 세계의 붕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저 날개가 사오 미터 정도의 큰 새이다. 가마우지도 나의 정신 세계에서는 제법 큰 새였는데, 가마우지가 나의 정신 세계를 난 지 삼십 년이 넘어, 실물을 보니 30~40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상상외로 작은 새였다.
붕과 가마우지가 나의 정신 세계로 들어온 건 삼십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다. 인구 5만의 작은 고읍, 경북 북부 지방인 나의 고향에는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렸다. 그날도 눈이 발목까지 쌓이는 골목길을 돌아 상주 포교당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붕과 가마우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이 깊은 젊은 스님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그분의 이름이며 얼굴은 세월의 풍화에 씻겨 버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붕의 웅장함, 그리고 붕을 타고 태허에 노니는 자유인과 목에 사슬을 매고 열심히 물고기 사냥하는 가마우지를 비교하며 조주 선사의 법언을 이야기했다.
“깨달은 자는 25시를 지배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25시를 사역당한다.”
그날 밤부터 붕과 가마우지는 내 정신 세계에 둥지를 틀었다. 고등학교 2학년, 갈등과 꿈이 회오리처럼 철렁이는 그때부터 오십이 넘은 지금까지 늘 날갯짓으로 나를 괴롭히고 기쁘게 하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기분이 좋고 의욕에 넘치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어 마음이 넓어졌을 때는 꿈속에 대붕이 나타났다. 황금빛 날개로 푸른 하늘을 안고 아득히 먼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느릿느릿 날갯짓을 한다. 나는 대붕을 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붕이 되기도 하면서 아름답고 먼 섬으로 간다, 높고 아득한 산상에 서서, 아득한 하늘이며 바다를 보기도 하고 연꽃 만발한 연못가에서 달을 보기도 한다.
세상사가 괴롭고 송곳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좁아질 때면 나의 꿈에는 어김없이 가마우지가 나타난다. 가마우지가 되어 잡은 고기를 삼키려 할 때 목에 감긴 밧줄 때문에 캑캑거리다가 잠을 깨면,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망을 헤매는 자신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몇 달 전 중국 여행을 하다가 가마우지를 실제로 만났다.
그때의 경이감, 혹은 허탈감은 엄청난 것이었다.
삼십 년 넘게 나의 꿈속에서 날갯짓하던 가마우지.
중국 남쪽에 있는 계림은 산부터 기묘하게 생겼고, 모든 자연이 경이적인 땅덩이였다.
“세상에, 이런 땅덩이가 있다니!”
처음 계림을 대하는 나의 탄성이었다. 강을 가로질러 선상 유람을 하기 위해 선창에 갔을 때, 한 중국 노인이 새 두 마리를 가리키며 사진 찍기를 권하였다. 그때까지도 그 새가 가마우지인 줄 몰랐다. 새 아래 팻말에 한글로 가마우지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한참을 서 있었다. 삼십 년을 나의 꿈속에서 퍼덕이던 너,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마우지에 다가서며 날개를 만져 보려 했다. 그랬더니 그 날카로운 부리로 나의 손등을 찍으려했다. 중국 노인이 무엇인가 모를 소리를 지르며 그 부리를 막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렸을 것이다.
“아하, 너와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한국 관광객이 많아 가마우지라는 한글도 썼겠고, 그 노인도 한국말 한두 마디는 아는 듯하기에, 한국어로 한 번 만져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다. “사진, 사진”하며 손가락 두 개를 펴 “이 원, 이 원”했다. 내 카메라로 찍는 데 이 원이었다. 날카로운 눈매며 부리는 나의 꿈속의 세계에서 날갯짓하던 가마우지와 비슷했지만 몸매는 상상 밖으로 작은 새였다. 중국 계림에서는 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