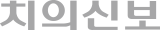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오세훈 치과기공사'의 전체기사
-

시간아 멈추어다오
얼마 전 여수에 다녀왔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짐을 꾸리고 차량에 몸을 맡겼는데 이 만큼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 그간 바빴던 일상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여행은 이렇게나 행복하구나 싶었다. 힐링이란 이런 것일까?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말로만 듣던 여수 밤바다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 아침부터 들떠있었다. 문득 어릴 적 들었던 ‘초록바다’의 노래 중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이라는 구절이 떠올랐는데, 사실 이 노래는 나 같은 ‘어른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었다. 여수는 집에서 의외로 멀었다. 6시간이나 걸렸는데, 가는 길 중간마다 창밖에 비춰진 하늘을 보기도 하고 잠이 쏟아진 탓에 쪽잠을 자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는 길마다 펼쳐진 풍경들을 내 눈에 조금이나마 더 담아둘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마치 구운몽을 겪은 것 마냥 한 순간 꿈이었던 느낌이 들고 있어서다. 여수로 가는 도중엔 옆으로 갈라진 산을 지나가며 봄의 느낌을 완전히 몸으로 받았다. 멀리서 보이는 새싹 하나부터 그득한 나무들까지 봄의 양기가 느껴져 기분마저 상쾌해졌다. 절로 휘파람이 나오니 너무 좋은걸?
- 오세훈 치과기공사
- 2022-05-02 10:22
-

이불이 전한 행복 메세지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한창 유행인 적이 있었다. 한창 사건 사고가 많아서, 혹은 세상살이가 팍팍해서 그런지 ‘툭!’ 하고 누군가 내뱉은 말이 남녀노소 공감을 일으킨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 접어들고 사회 발전에 따라 우리 일상도 다양성이 커지면서 사건 사고도 다양해졌다. 뉴스를 접하다보면 정말 ‘엽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밖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저 무서운 마음이 든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몰려든 일거리를 발 빠르게 처리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순간마다 ‘괜히 이불 밖이 위험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매 순간 종종 들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말은 개인마다 찾아오는 이러한 일상의 어려움이 이미지화 된 것 같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잠깐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부자리는 일상을 벗어나 그 이상 안락할 수가 없는 휴식 공간이지 않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순간이 이부자리 외에 또 있을까? 물론 다음날 이어질 고된 일상을 생각한다면
- 오세훈 치과기공사
- 2020-11-1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