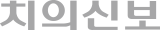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농촌에 대한 기억들뿐이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인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지금의 천왕동은 고층 아파트와 지하철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이지만 70년대 중 후반까지도 그 곳은 완전한 농촌지역이었다. 하루에 몇 번 없던 버스도 족히 이삼십분은 걸어나가야 이용할 수 있었다. 주위에는 산과 들 뿐이었고 딱히 재미있을 거리는 없었다. 누구나 지루하게 살았음직한 그런 시골동네가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거의 40년 전 그 때의 그 장소로 나를 잠시 옮겨서 잊지 못할 기억들을 몇 가지 써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마을사람들을 온통 분노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 이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반성문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농촌에 대한 기억들뿐이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인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지금의 천왕동은 고층 아파트와 지하철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이지만 70년대 중 후반까지도 그 곳은 완전한 농촌지역이었다. 하루에 몇 번 없던 버스도 족히 이삼십분은 걸어나가야 이용할 수 있었다. 주위에는 산과 들 뿐이었고 딱히 재미있을 거리는 없었다. 누구나 지루하게 살았음직한 그런 시골동네가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거의 40년 전 그 때의 그 장소로 나를 잠시 옮겨서 잊지 못할 기억들을 몇 가지 써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마을사람들을 온통 분노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 이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반성문이기도 하다.
유리는 깨지는 물건이고 빗자루는 용도가 다양하다
때는 바야흐로 새마을운동의 시기, 아마도 여름이었던 것 같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도랑을 넓혀서 관계수로를 확보하고 우물을 정비하고 토담을 이룬 초가집을 계량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당연히 나의 부모님들도 다른 분들과 함께 마을 바꾸기에 여념이 없었을 터였다. 혼자 남은 무료한 시간을 주최할 수 없었던 나는 마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어른들의 노동을 눈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담벼락에 비스듬히 새워놓은 꽤 크고 많은 양의 유리가 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크고 많은 유리는 전에는 본적이 없었다. 아마도 주거시설 계량에 사용될 정부 지원품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손을 대보니 차갑고 매끄러웠다. 투명하지만 보기에는 묵직해 보였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나의 손에는 주먹만한 돌이 쥐어지고 차곡차곡 겹쳐놓은 유리에 돌팔매를 시작했다. 하나씩 깨져나가는 모습이 재미있게 보였던 것일까? 이것이 기억나는 첫 번째 악행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빗자루가 가장 강력한 체벌수단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기억은 누구나 다 있을 것도 같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무서워서 그랬어… 미안해…
장난감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새총이나 활을 장난감으로 자주 만들어 주셨다. 아버지 탓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활보다는 장난감을 사주셨더라면… 아버지가 새 활을 만들어주실 때면 나는 늘 의기양양했다. 묵직한 활에 날렵해 보이는 화살을 시위에 올려 날려보내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도 궁금했고 아주 가끔 원하는 것에 명중시키면 신이 나서 깡총거렸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내가 마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개였다. 이 영악한 녀석들은 내가 지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눈에 띌 때 마다 으르렁거리고 짖어댔다. 그 시절 시골 동내에서는 어째서 개들을 묶어놓지 않고 풀어서 키웠던 것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새로 만들어준 활을 들고 집밖을 나섰다. 가까운 곳에 나무 하나를 과녁 삼아 그저 활 시위를 몇 번 당겼을 뿐인데 느닷없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며 나에게 달려오는 그 녀석, 줄행랑 외에는 저항하거나 제압할 방법이 없으니 가는 곳도 모르고 달음박질을 했다. 그 녀석은 다른 개들과 달랐다. 참 빠르기도 했고 유난히 커 보였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꽁무니에 따라붙은 개를 향해 활을 날렸다. 아뿔싸! 그런데 명중이다. 녀석의 눈에 활이 박혀 버렸다. 녀석은 고통에 날뛰기 시작했고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명중에 대한 희열은 전혀 없었다. 그저 무섭기만 했다. 진심으로 그 녀석이 밉지는 않았다. 그저 무서웠을 뿐이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평생 외눈박이로 살았다는 후문을 들었다. 지금도 그녀석 에게는 미안하다.
네놈 때문에 못 살겠다. 마을을 떠나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압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마을 퇴출 사건’ 이었다. 40여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추억 아닌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실로 엄청나고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가 주업이었다. 봄이면 농번기가 시작되고 이앙기가 없었던 그 때는 긴 새끼줄에 일정하게 매듭을 만들고 새끼줄을 옮겨가며 매듭 위치에 따라 모를 심었다. 그러다 보니 논에 심을 모를 다발로 묶어 논두렁을 따라서 죽 늘어놓게 된다. 역시나 혼자 심심한 나는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모심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새참시간, 어른들은 모두 막걸리를 곁들여 참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모 다발을 풀어 해치고 논 이리저리 던져버리거나 풀숲에 흩으러 놓기 시작했고 몇 다발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마을 어른에게 검거(?) 되었다. 그리고 이른 여름 언제인가 넓은 가지 밭에 내 손가락보다 약간 굵은 가지들이 짙은 자주색을 내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다 익은 것 같아 보였고 맛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밭 두렁을 따라가면서 실해 보이는 녀석을 모두 따가며 맛을 보고는 떫은 맛에 내동댕이쳐버리고 어떤 것은 가지를 통째로 꺾어내기도 하면서 한참을 가지 서리에 여념이 없다가 밭 주인아주머니에게 들켜 혼꾸멍이 나고야 말았다. 어디 이뿐이랴! 근처 과수원 자두 밭에 들어가서는 아직 익지도 않은 자두를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를 꺾고 따재끼다가 현행범으로 주인에게 체포되어 손해배상을 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그 마을의 한 해 농사는 내 고사리손에 의해 망가지고 있었다. 그 이듬해 우리 가족들은 옆 마을로 이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도 간혹 추억 삼아 그때의 이야기를 하신다. 이제는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 이지만 그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속이 많이 상했었다고…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 이후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나의 악행도 끝이 났다. 딸만 셋을 키우는 나도 가끔은 아이들로 인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의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는 짐작이 된다. 어버이날 마주한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어 보였다. 그 주름 골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다. 만들어드린 주름을 다시 펴드릴 수는 없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마관욱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