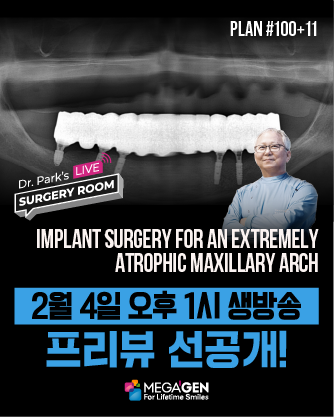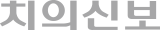인생 10년차가 되기도 전에 나는 엄마의 임종을 마주해야 했다. 새벽을 깨우는 누군가의 손짓. 엄마가 위독하시다. 가족들이 엄마 주위에 모여 기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다. 3개월 정도의 짧은 투병 기간을 엄마는 고스란히 기도의 시간으로 버티셨으며 특별한 유언 없이 떠나셨다.
집에서 치르는 3일의 장례는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어린이가 염이며 입관식을 처음 보았으며 그 죽음의 장본인이 나의 엄마였으니... 나는 죽음이 무서웠다. 관계의 강제 종료가 주는 어이없음보다 움직이지 않고 시들어가는 엄마의 차가운 육신이 공포스러웠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누워계셨던 그 방에 감히 혼자 있지 못하였다.
엄마 추도식 1주기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재혼하셨고, 나는 여전히 위로받지 못한 채 불쌍한 아이 정도로 회자 되었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을 누군가를 찾지 못하여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내 유년 기억 중에 찾지 못하겠다. 사소하고 소중한 관계 맺기를 이때 학습하지 못하여서 나는 이후 꾸준히 실수하고 망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대학동기들 딱 절반이 결혼하였을 때, 중간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새로 시작하는 출발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질렀고, 또 아는 거 하나 없이 엄마가 되었다. 출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고 쇼핑하면서 삼십 대를 보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고 살짝 겁이 나는 시간도 있었다.
유년기의 나는 어떠한 사교육도 접해보지 못했다. 그 흔한 주산학원이나 학습지도 내 것으로 풀어본 적이 없었다. 피아노, 영어, 중국어,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태리 요리, 한식 요리, 북클럽... 나는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의 결핍을 허겁지겁 채워나갔다.
그새 서너 번의 마이너한 병명이 나를 관통해갔으나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고, 또한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어 이십 대에 들었던 보험금을 수령하는 웃픈 일이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행운에 균형을 맞추기라도 하듯 수술 후 있음직한 모든 후유증을 매번 경험하면서 올바르게 기능하는 몸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항암 중이었고, 아버지의 잔여 삶이 아주 조금 남았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요일 아버지 병실에서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시답잖은 농담을 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거리다가 집에 돌아온 적이 몇 번이었다. 세상은 COVID-19가 우리 일상을 토네이도처럼 훑고 지나는 중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나는 다시 죽음을 본 거 같다. 무기력하게 사람을 점령하는 그 무자비함에, 나는 가슴에 불이 붙어 심장이 녹는 거 같은 슬픔으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하였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는 두려움으로 아버지와 나의 감사의 시간을 둥둥 흘려보낸 것이다.
지난 나흘 동안 저는 언니, 오빠, 동생과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반복하여 식사를 함께 하며 성년 이후 가장 긴 동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 중에도 마치 가족여행을 온 것 같은 흥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께 절하고, 꽃을 드리고 식사나 다과를 하고, 사소한 대화를 한 모든 일들이 장례식장이 아닌 아버지의 거실에서였다면 좋았었겠다 생각해봅니다.
문자로, 방문으로 먹먹한 이별의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지난 며칠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간의 효율을 추구하던 내게 갱년기 즈음하여 찾아온 손님은 공황이다. 여섯 살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나는 운동회 때 아이들이 무리로 움직이면서 몰리면 그 기세에 눌려 그냥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흙냄새며 번잡함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몸의 기능이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릴 때 그 시절 연약한 고리가 다시 튀어나온 거 같다. 미래의 어느 날을 생각하다 드는 현기증은 먼지냄새 나는 운동장을 기억나게 했다. 멀쩡히 호흡하고 있는데 숨을 쉬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 강박은 결코 컨트롤 할 수 없는 인생의 냉소 같았다.
직선적 세계관으로 이미 알파를 출발한 지 오래.
오메가를 향해가는 내가 타협한 삶과의 절충안은 들꽃에 눈길을 주고, 무탈한 하루에 감사함을 갖고, 적절히 걷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
뜬금없이 지난 아버지 기일에 무덤가에 심고 온 어린 꽃나무 한 그루의 안녕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