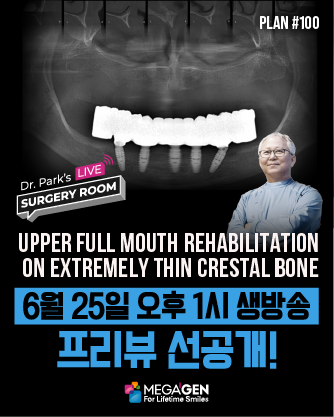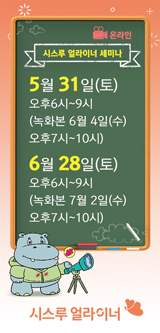타자, 욕망, 운명
프로이트는 “그것이 있던 곳에서 나는 생성하리라(Wo es war, soll ich werden)”고 했다. 나의 생성을 좌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것도 어릴 때 형성된 무의식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워즈워드)라는 말은 정신분석학에서 또 다른 뉘앙스를 획득한다.
그것은 나=자아에게 타자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타자=다름은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안에 나의 타자=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이 던져주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이다.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는 언어, 기표의 장소, 상징계이다. 이 상징계는 어린아이가 상상계에서 그곳으로 옮겨갈 때 어린아이의 무의식에 자리잡는다. 어린아이는 상상계의 달콤함과 환상을 포기하는 대신 상징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선다. 또 타자란 상호주체성의 장이다. 상호주체성은 개별적인 주체들 사이에서 추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호주체성의 장 내에서만 주체들은 주체들일 수가 있다. 상징계에 들어서는 동시에 개인들의 무의식에는 상호주체성이 각인된다.
헤겔에게서 한 인간의 주체성은 타자를 통해서만, ‘자아 속의 이상한 자아’로서의 타인을 통해서만 형성된다(인정투쟁). 라캉에서도 자아는 자신 속의 이상한 자신으로서의 타자=무의식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상징계는 팔루스이며 상징계를 채우고 있는 욕망은 팔루스에의 욕망이다. 팔루스는 욕망의 기표이다. 욕망은 팔루스라는 기표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욕망은 욕구, 갈구/요구와 다르다. 욕구는 생리학적 필요이지만, 요구는 타인에 대한 간청이다. 어린아기는 사탕을 욕구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갈구한다. 욕구는 사물들을 향하지만 요구/갈구는 사람들을 향한다.
이에 비해 욕망은 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욕망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에서 온다. 결핍은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 이미 형성되는 인간의 원초적 조건이다. 인간은 그 최초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기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는다. 그 원초적 결핍으로부터 욕망이 나온다.
욕망의 근원적 기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미 상징계로 들어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욕망의 기표는 팔루스이다. 그러나 욕망 자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팔루스를 욕망하는 것은 주체가 되기 위한 것, "인간"이 되기 위한 것, 일종의 타협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정신병을 앓기 때문에 거치는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도대체 욕망이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실재계를 영원히 알 수 없듯이 이 또한 알 수 없다. 라캉은 이 곳을 ‘신화의 세계’라 부른다. 인간은 어떤 쪼개짐으로써 갈라짐으로써 인간이 된다. 로고스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이 동시에 분열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얄궂은 상황이다. 따라서 욕망의 근원적 기의는 그 어떤 쪼개짐도, 갈라짐도 없는 그 어디일 것이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라캉적인 의미에서의 ‘운명’이다.
라캉은 욕망과 욕구 사이에 ‘충동(pulsion)’을 넣는다. 충동은 한편으로 욕구와 유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성애적(性愛的)’ 측면을 띤다는 점에서 욕구와는 다르다. 충동은 생리학의 영역에서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존재한다.
인간이 욕망의 존재인 한 인간은 번뇌의 존재이다. 도덕이나 윤리는 상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며,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번뇌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캉에게 번뇌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왜 그렇게 번뇌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번뇌의 실체를 알게 되며 그로부터의 공허만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라캉의 사유는 불교와 접맥된다.
<다음호에 계속>
철학아카데미 02)722-2871
www.acaphil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