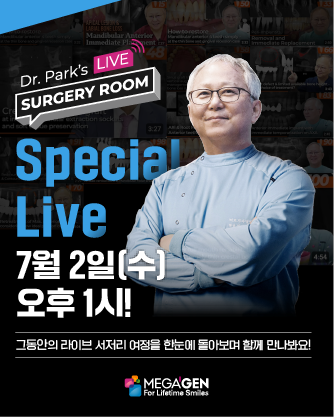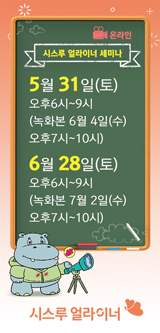미국 같은 치과 선진국에서도 치과의료자원을 이용하는 수치는 전체인구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미국 전체 치과시장을 좌우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소수계층만이 치과 이용도가 높을 뿐 균형있는 치과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과연 20%정도 수치에 미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잠재적인 수요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잠재적 치과의료 수요를 감안한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치과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함을 의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치료가용자원과 잠재적 수요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치과의료 자원이 인구에 비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가 비슷한 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 치과의사들은 여유롭게 자기일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치과의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며 또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들의 생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WHO(1978년)의 평가에 의하면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일년동안 온전한 치주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수는 500명 내외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사를 약 1만명으로 잡고 1년에 고작 5백만명 밖에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 인구의 반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다. 치주치료 경우만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충치치료, 보철, 교정 같은 치료를 첨가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왜 환자가 없다고들 아우성인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과환자 자원의 개념이 매우 편승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복치료 지향적으로만 치닫고 있는 치료 성향 때문에 예방치료 성향인 치주치료나 보존치료쪽을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 때문에 환자 자원의 협소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불합리한 보험제도의 탓이 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 병원문이 군데군데 활짝 열려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치과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까닭은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다른 질환개념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직도 치의학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건강(Health) 보다는 미용(Cosmetic)이나 편안함(Comfort)의 추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정교합을 악골과 치아배열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의 개념과 외모와 미관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 일반 대중적 개념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과 안녕이란 것은 한 개인이 매일매일 통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구강질환은 기능상의 부조화나 능력저하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정상생활을 하는데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심한 구강질환의 경우에라도 ‘사소한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강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치과를 방문해 치료환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건강이 악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과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는 동기는 치료할 의지가 있고 계속 치료 받을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다. 때문에 치과환자의 관리는 불가피해서 찾게 되는 급성질환 환자나 다른 질환 환자보다는 환자와 의사간의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다.
급성질환 환자는 의사의 권위가 인정되고 의사의 필요성이 긴박할 수도 있지만 치과환자의 경우는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존중, 상호협조가 강조되는 평등한 고객상담의 성격을 더 많이 띄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치과의료자원(환자)의 확보는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