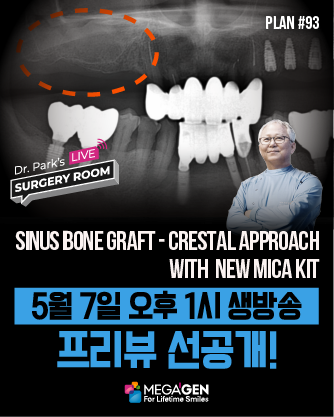나의 사랑 영희가 성숙한 여름 가을의 문턱에서 “난, 반딧불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
40년 전 우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여름 하늘에는 별처럼이나 많은 반디들이 날아다녔다. 우리들은 박꽃이나 호박꽃에 넣어 등을 만들어 들고 다녔다. 짓궂은 친구들은 불을 떼어내어 눈썹에 붙이고 다녔다. 영희는 그 반디를 보고 싶어했다.
나는 영희를 태우고 작년 여름 반딧불을 보았던 가창면 우륵리의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으나 반딧불을 볼 수 없었다.
영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농약이 뿌려진 이 곳에는 반딧불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나는 분명 작년에 이 곳에서 반딧불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은 몇 시간이나 지켜보았지만 반딧불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혹시 반딧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요즈음은 본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아예 반딧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토착민 몇 사람에게 물어 보았지만 아직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와 나는 울며 울며 돌아왔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KBS 뉴스에서 ‘무구구천동 반딧불이 축제’를 볼 수 있었다. 마음으로 염원하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여 주는구나, 감사히 생각하며 TV를 보았다. TV에서 반딧불을 몇 마리 보았느냐는 질문에 아이는 ‘두 마리밖에 못 보았어요’라고 대답했다. 반딧불 축제까지 열린 곳에서 반딧불을 두 마리밖에 볼 수 없다니 참으로 반딧불은 희귀한 존재구나! 영희와 나는 반가우면서도 뭔가 잃어버린 듯한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었다.
옛날에는 ‘반디’라 하든가 ‘반딧불’로 불렀던 것을 왜 국문학자들은 ‘반딧불이’라고 터무니없는 낱말을 새로 조작했을까?
반딧불이의 ‘이’자는 반딧불을 내는 것이란 의미로 최근에 ‘이’자를 추가하여 붙였다고 한다. 반딧불이는 어림도 없는 이름이다. 반디가 없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름까지 마음대로 바꾸다니!
벌레를 나타내면 그냥 반디라고 하고 불을 나타내면 반딧불이라 부르면 될 것이다. 또 양자를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리라.
일주일 있다가 이월 초 나는 고향 달성군 다사면 박곡동 금호강둑을 찾았다. 와룡산 정기를 받아 상서로운 달빛을 내뿜는 금호강둑에 반딧불이 날고 있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백 마리 이백 마리......수도 없이 많은 반딧불이 풀숲에서 기어다니고 하늘을 힘차게 날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재주를 부리는 놈, 맞바람을 받으며 돌진 해오는 놈, 끝없는 윤무(輪舞)가 펼쳐졌다. 하늘에서는 별빛이 쏟아지고 내 가슴속에는 저 반딧불 같은 빛으로 순수와 꿈과 낭만과 사랑이 제 모습을 드러내려하고 있다.
아 황홀한 장관!
영희는 소리쳤다.
나는 반딧불 사랑이 좋아요!
태우지 않으면서 비춰줄 수 있는
반딧불 사랑이 좋아요!
새벽공기처럼 가을 냇물처럼
야단스럽지 않고 차고 맑은 사랑
반딧불이 좋아요.
반디를 보면 무저항, 무공해의 맑은 영채가 생각난다. 반디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상징이며 환경의 척후병이다. 이 지구에서 반디가 멸망하는 날, 인류의 등불은 꺼지리라.
반디를 사랑하자!
반디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