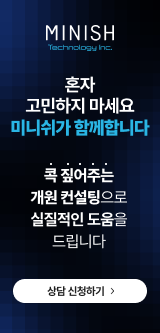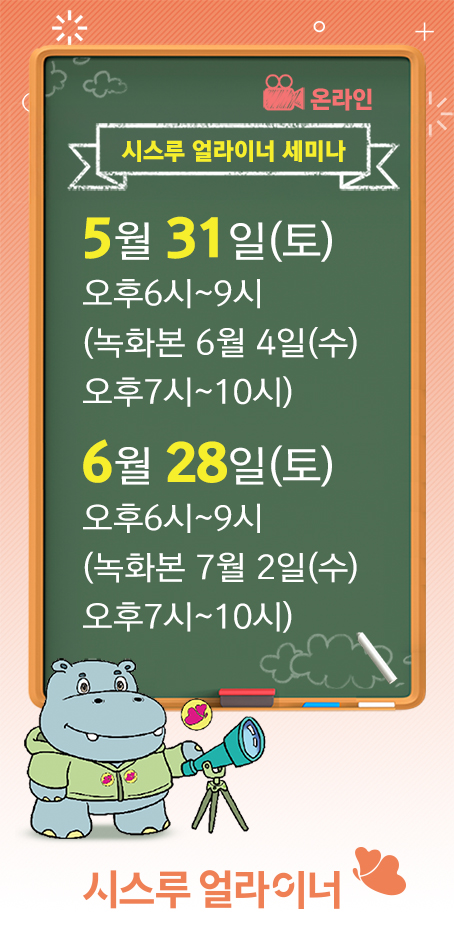말에는 고유한 정신이 담겨 있는 만큼 이왕이면 건강한 정신이 살아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정신문화를 올바르게 가꾸어 가자
그 나라의 국민성은 속담을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등의 속담 역시 그러하다. 이는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하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목적을 이룰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 특유의 국민성인 ‘은근과 끈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정신을 키워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반면 그다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속담들도 더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다. 서울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다.
만약 인천에서 버스로 출발해 수원을 거쳐 안성까지 간 이후 다시 택시로 갈아타고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간다면, 이는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속담 내용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더욱이 이 속담은 흔히 정당하게 거쳐야 할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종종 쓰이고 있어 문제다. 즉, 수단이야 어떠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심하게 해석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약 어떤 아이가 “엄마, 오늘 아침에 버스 탈 때 새치기해서 다행히 학교에 안 늦었어요”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그래 잘 했다. 학교에 안 늦었으니 됐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요령을 발휘하렴”이라고 대답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대화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나는 이 사회에 위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요령을 동원하여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상이 만연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문화이다. 어떻게든 자기만 빨리 가려는 마음에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끼어들고, 새치기하고, 또 양보를 모른다. 그러면서 자책감조차 못 느낀다. 오히려 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수완을 잘 부린 덕에 빨리 빠져 나왔다고 좋아한다.
내가 위의 속담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이끌어낸 이유는 단지 애꿎은 속담에 분풀이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말에는 고유한 정신이 담겨 있는 만큼 이왕이면 건강한 정신이 살아 있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정신문화를 올바르게 가꾸어 가자는 의미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다. 어찌하여 이런 속담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지 나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속담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 이는 한 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소리 아닌가. 그렇다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와 정신을 강조했던 우리 옛 선조의 가르침은 어디로 사라지고 만 것일까.
우리 나라 국민들은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고 한다. 이는 곧 자기 입장만 중시하고 자기 귀한 줄만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이 사촌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제 3자든, 그가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행하였으면 칭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도 어찌 우리 국민은 박수갈채를 보내는 대신 아픈 배를 움켜쥐고 속상해 하는 것일까.
지금은 바야흐로 새로운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서 열린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색한 국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무장해 있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한 박수와 칭찬에 인색한 국민들의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사고와 생활습관은 변해야 한다. 질서를 생활화하여 일상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전세계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의 성숙한 문화시민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