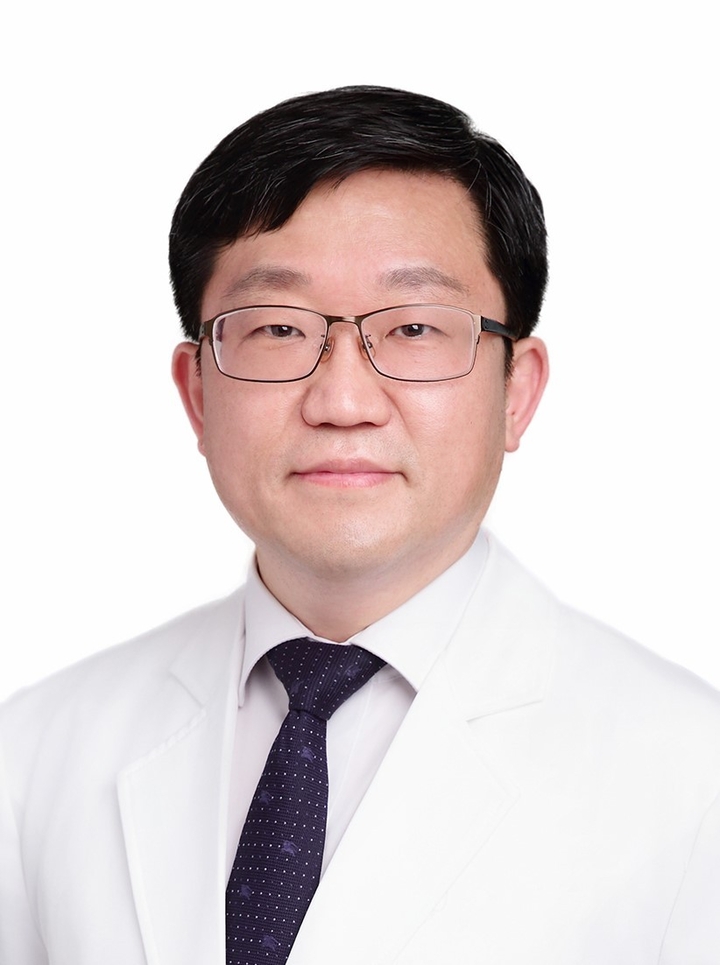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韓愈)는 인재를 육성하는 안목의 중요성을 천리마를 키우는데 빗대어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천리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를 알아보는 백락(伯樂,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말감별사)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千里馬常有 白樂不常有, 천리마상유 백락불상유). 그러므로 비록 명마가 있다 하여도 백락이 없으면, 명마가 하찮은 말들 틈에 섞여 아랫것들의 손에 의해 길러져 마구간을 배회하다가 죽게 될 뿐, 결코 천리마의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은 한 끼에 곡식 한섬을 다 먹는데, 그 말을 먹이는 사람이 천리마를 못 알아보고 보통 말을 먹이듯이 하니, 그 말이 비록 하루에 천리를 내닫는 능력이 있어도 먹는 것이 변변치 못하여 힘이 부족하니 어찌 재능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천리마가 서럽게 울며 자신의 뜻을 전하려 해도 주인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천하에 좋은 말이 없도다’ 하니, 오 슬프다. 세상에 천리마가 없는가 아니면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 없는 것인가?” - 고문진보 후집, 문편, 잡설 雜說.
요즈음 우리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어서 미래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교육의 한계로, 또는 나의 한계로 인하여 뛰어난 학생이나 전공의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다. 좀 더 뛰어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재가 부족한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인지라 학생들이 하루 천 리를 달리는 말인지 십 리밖에 못 달리는 말인지 내가 백락이 아니니 볼수록 헷갈렸다. 원래 십 리도 가지 않는 게으른 말인 줄 알았는데 졸업하니 천리마 역할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천리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천리마인 줄 알고 애써 키웠더니 “알고 보니 망아지”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없는 것이다. “그걸 그토록 애써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해 못 하는 애들이 있어”라는 말은 교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도 않는 게으른 천리마와 죽으라고 뛰어도 십리밖에 못 뛰는 근면한 망아지 중 누굴 더 신경 써서 키워야 하나? 마구간에 온통 망아지뿐인 것 같은 경우 천리마처럼 잘 먹이고 잘 키워본들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미국 방문교수 시절 우리 집 아이의 첼로 개인교습을 맡았던 H 선생님의 교육방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H 선생님은 아이의 중학교 오케스트라 담당 선생님이 추천하여 처음으로 만났다. 레슨 시간 내내 같이 연주를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필요 없이 실력이 다 들통나게 되어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애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잘 안되는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악보를 무한반복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칭찬하였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아이가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도록 작지만 계속적인 변화와 자극을 주고, 마스터하기 어렵다 싶은 악보를 마침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각각의 악보에 적힌 음표의 의미를 세밀하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어떤 분위기로 연주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로 아이의 실력이 매달 믿을 수 없이 향상되었고, 이 때문에 첼로 연주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첼로 연주를 계속하지 못했지만, 그저 평범했다고 여겼던 아이의 연주 능력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은 값진 경험이었다.
H 선생님을 보면서 망아지든 천리마든 자신이 달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다는 것을 느꼈다. 아낌없는 정성으로 학생 자신이 가진 능력 100% 이상을 발휘하게 만들 것, 그 과정 동안 조건에 좌우되지 말 것, 그리고 학생의 게으름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 것, 그것이 앞으로 내 앞의 잠재적인 “망아지” 혹은 “천리마”들을 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노마십가(駑馬十駕)라는 말이 있다. “무릇 천리마는 하루에 천 리를 달리지만(夫驥一日而千里 부기일일이천리), 걸음이 느린 둔한 말도 열흘을 달리면 또한 천 리에 이를 수 있다(駑馬十駕 則亦及之矣 노마십가 즉역급지의)”는 뜻이다(순자 荀子, 수신편 修身篇). 천리마가 원래부터 있어서 백락과 같은 이가 알아보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범한 말들이라도 귀하게 여겨 천리마처럼 키운다면 천리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던져놓는다면 결국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망아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천리마처럼 달리겠다고 결심하게 만들면 정말로 천 리를 가게 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