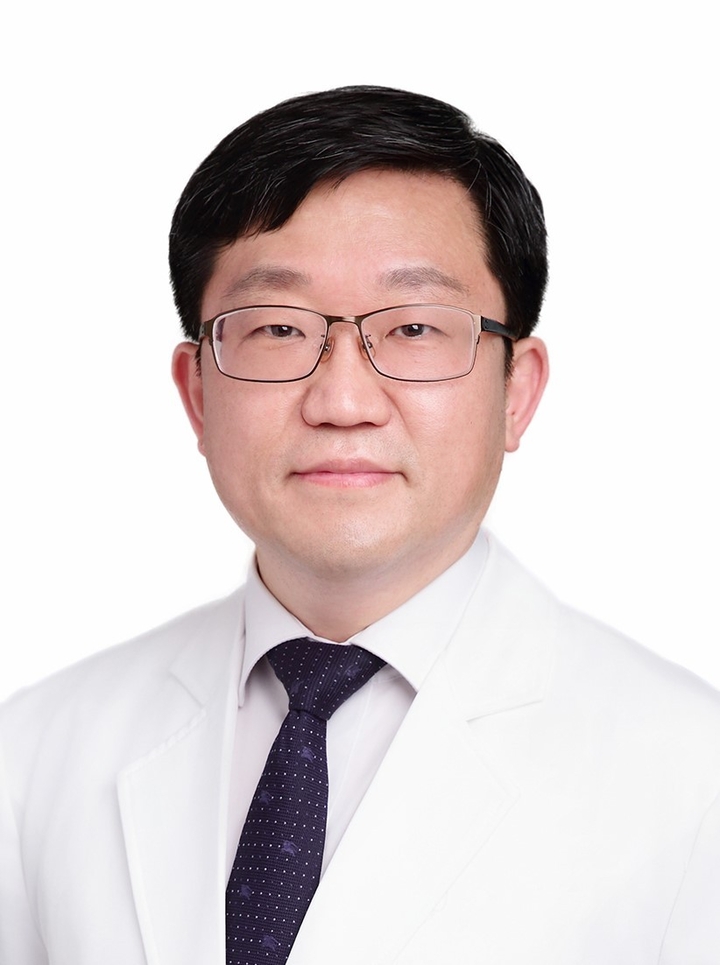
2005년 임신한 Leilani Schweitzer는 네바다의 한 지역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음 해 아들을 무사히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생후 4개월이 되어 수두증(hydrocephalus)으로 진단받아 두개강 내압을 감소시키려고 뇌실에서 복강으로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시술을 받았다. 아이는 급속도로 좋아졌고 잘 자랐다. 생후 20개월이 된 어느 날, 아이는 장염 비슷한 증세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두증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지역병원에서 스탠퍼드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입원하자 안심이 되었고, 엄마나 아이나 며칠간 밤잠을 자지 못한 관계로 병동 간호사는 병상 앞의 모니터 음을 소거하여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간호사가 지친 엄마를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병실 모니터뿐만 아니라 간호사실을 비롯한 모든 곳의 기기 경보음을 무음으로 해 놓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한밤중에 아이의 심장이 멈췄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Leilani의 어린 아들은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아무 이유도 모른 채로 사망한 것이다.
어머니 Leilani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1)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이야기해 줄 것, 2) 아들이 사망한 데에 대한 병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것, 3) 향후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에 명확한 변화가 있을 것, 즉 의료사고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사과-변화”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스탠퍼드는 해당 간호사를 징계하여 개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망의 원인이 된 병원 시스템의 모든 문제점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고, 최종적 해결책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실하게 변화시켰다. 게다가 스탠퍼드 대학병원은 이후 그녀를 환자와 소통하는 책임부서의 담당자로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 이야기는 의료사고가 있은지 7년이 지난 2013년 Leilani가 Tedx Talks에서 “Transparency, Compassion, and Truth in Medical Errors”라는 테마로 강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거기서 그녀는 의료진들에게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선의를 다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내가 주목한 것은 그녀가 사망한 환자의 어머니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러한 의료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실(Truth)과 연민(compassion)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담당 간호사는 환아가 사망한 그다음 날 바로 병원을 사직하여 다시는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주치의였던 소아 신경외과 의사도 이후 의사직 자체를 완전히 관두었다. 아마도 그 의사는 업무를 계속하면 또한 미래에 유사한 경우를 또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한 경험의 반복을 피하고자 - 많은 의사가 그런 선택을 한다 - 유능했던 신경외과 의사 경력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치유가 잘 되었던 훌륭한 증례보다도 사망하였거나 큰 후유증을 남긴 환자에 대하여 더 자주, 또렷하게 기억해 낸다. 더군다나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라 오류에 의한 결과는 잊을 수가 없고 자책감이 훨씬 더하다.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경험하며, 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일차적 희생자, primary victim)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 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심리적인 반응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 의사는 자신이 주도한 치료 과정의 오류가 환자에게 미치는 후유증을 보면서 많은 자책과 분노, 평판의 저하, 본인 능력에 대한 회의,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의사를 이차적 희생자(secondary victi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의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본인이 그와 유사한 사고의 당사자가 되어 보아야 비로소 피부로 느끼게 된다.
치료 과정에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온몸의 교감신경이 일제히 자극된다.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 비행장 상공을 떠도는 비행기처럼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이 환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뱅뱅 돌게 된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환자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혼자만의 자책에서 벗어나 일단 이미 초래된 의료사고 결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동료나 병원에 털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하여 동료들과 논의하다 보면 마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수술의 오류, 치료 과정의 실수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 피할 수가 없다. 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 보고, 그 사건들을 정량화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사고가 좋은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의사도 환자도 원하는 제일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되어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의료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진이 제대로 된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환자 진료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