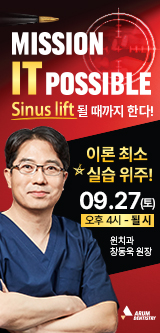이정근 교수의 지상강좌
“치과의사들이 알아야 할 턱뼈 괴사:BRONJ”
BRONJ의 검사실 소견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작용 기전이 파골세포의 기능 억제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골다공증 환자의 BRONJ 예지자로서 활용되는 type I collagen C-telopeptide crosslink (CTX)이 있다. 원래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성적 및 투약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compliance) 확인을 위하여 골회전율 표지자 (bone turnover marker)로서 이용되던 CTX는 NTX와 함께 파골 세포의 기능 평가에 사용되는 I형 교원질 종단 펩티드 (telopeptide) 중 하나이다. CTX는 증령과 관계되어 I형 교원질 카르복실기 종단의 α-1 사슬이 펩티드 사슬 재배열 (β-isomerization) 시 생성되는 사슬 간 연결로, 파골세포에 의해 분해될 때 교원질의 카르복실기 종단부에서 유리되는 성질이 있어 일찌감치 파골 세포 활동의 표지자로서 활용되어 왔다1(Fig 1). 현재 혈청 CTX (sCTX)는 EKAHD-β-GGR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ELISA로서 검출되고 있는데2 CTX가 골흡수 억제 효과 및 골흡수능에 NTX보다 민감해서 BRONJ의 예지자로서 흔히 사용된다3. Marx는 CTX 측정치가 100 pg/mL보다 낮으면 고위험군, 100 pg/mL에서 150 pg/mL 사이이면 중등도의 위험군, 그리고 150 pg/mL 이상이면 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4(Fig 2). 하지만 이 수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가 현재 BRONJ로부터 안전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BRONJ로 이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관한 위험구역 측정 (risk zone determination)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5. CTX 측정치로부터 BRONJ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 1개월의 bisphosphonate holiday 시기 당 CTX 측정치가 25pg/mL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4,5. 이 점은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중단 후 적절한 치과 치료 시기를 가늠하는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BRONJ의 위험 요소
가장 강력한 위험요소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능이다. 효능이 강한 약제일수록, 투여 기간이 오랠수록 BRONJ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 전이성 골질환 (metastatic bone diseases), 악성 질환 (malignant diseases)의 경우 고용량의 정맥투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파젯씨 병이나 골다공증의 경우 저용량의 경구 투여가 일반적이다. 대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고농도로 정주 시 발생률이 1.8~12%로 보고된 반면 경구 투여의 경우 0.01~0.001%의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6,7. 경구 투여의 경우라도 투여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발생률이 증가한다. 대체로 5년의 투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정도의 drug holiday가 추천된다8.
<28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