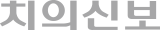Relay Essay
제1843번째
농부가 되었던 하루
농사를 짓던 외할아버지 댁은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했다. 나의 엄마가 자라온 곳이며 어릴 적 내가 뛰어 놀던 곳이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개울이 있으며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돼지, 소, 닭, 심지어 타조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던 곳이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만해도 할아버지 댁에 소를 키웠었다. 맨날 외할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며 “으 소똥냄새나!”라고 외치면서도, 물릴까봐 무서워하면서도, 내가 여물 주겠다며 달려가서 사료통 앞에 던져놓고 오곤 했었다.
또한 농사를 지으셔서 하우스에서 딸기도 따먹고 뒷산 감나무에서 감도 따먹고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고구마도 심은 시골이라는 곳은 나에게 매우 많은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준 곳이다.
요즘 나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시골에 가는 친구들이 드물다. “명절에 시골가?”라고 물으면 “아니 나 시골 없어. 큰집이 서울에 있어서 1시간이면 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명절 때 3~4시간 고속도로에 서 있던 것도 나에겐 추억이 되었다.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걸 사먹는 것도 좋았고, 비탈길 때문에 잠도 못잘 정도로 덜덜덜 거리며 가던 것도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이 없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외갓집 식구들과 우리가족은 다 같이 일 년에 2번 농사를 지으러 간다. 올해 오월 셋째 주 주말에도 시골에 다녀왔다. 가족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농사의 상징 몸빼바지를 입고 고추와 깨를 심고 왔다.
어린 초등학생 친척동생들도 그 조그마한 손으로 흙을 퍼 주고, 고추모를 나르고 어른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꾸중을 주셨지만 이제는 스스로 잘한다며 칭찬해주셨다.
중간 중간 외숙모께서 새참도 준비해주셨는데 똑같은 밥이지만 농사를 짓다 먹으니 더욱 꿀맛이었다.
고추와 깨를 다 심고 나서 내가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시간에는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키우던 흑염소를 잡아주셨다. 한쪽에서는 흑염소가 끓고 있었고 앞마당에는 장작 위 솥뚜껑에다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어른들은 맥주 한잔씩 하시고 우리는 음료수로 목을 축이며 5살 된 친척동생의 노래와 춤 재롱을 보면서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온몸에 알이 배겼지만 밭에 심겨있는 고추들을 보며 매우 뿌듯하고 즐거웠다. 8월이나 9월이면 고추를 따러 가야하는데 그 때까지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
요즈음에는 가족들과 소통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바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날 일이 많이 없고 밥 한 끼 할 정도일 뿐이다. 그래서 농사를 통해 서로 살을 맞닿아 가며 땀 흘리고 서로 고생했다며 격려해주는 우리 가족이 나는 매우 좋다.
이런 추억들을 나중에 나의 자식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나의 제2의 고향인 부여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노주영
신흥대 치위생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