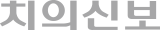Relay Essay
제1868번째
꽃보다 사람
#1 우리가 간다!
설렘보다는 걱정이 컸던 나는 조그마한 캐리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모두들 음용수를 포함하여 현지의 날씨에 대해 한 가득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현기증이 일만큼 햇빛은 뜨거웠고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과대망상병에 걸린 듯 상비약을 한 묶음씩 챙기며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너무도 챙기고 있었다.
구강악안면외과 신효근 교수님, 백진아 교수님께서 도착하셨다. 의아하리만큼 간소하고 편안한 복장이셨고 여지껏 자신을 너무도 챙기고 있었던 내 자신은 한 없이 작아지는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교수님들의 평온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챙긴 의료기구들만 해도 신기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지만, 전공의 선생님의 지도하에 철저히 준비하였고 공항에서의 부산스런 행동 덕에 안전히 비행기 내에 실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였었다면 가당치도 않았을 ‘합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는 위대하다.
#2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너희는 아는지…
전주에서 인천, 인천에서 다낭, 다낭에서 후에까지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멀미약 생각이 아련해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일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봉사’라는 의미에 대해 곱씹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12시간은 넉넉했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막연히’ 다짐했던 생각이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순간을 보았고 동시에 ‘어쩌면 실현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냉철한 생각이 자꾸만 나를 파랗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19년 간 계속해 오신 신효근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수식어구 없이 ‘나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3 우리를 보는 수많은 눈들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 그야말로 열악했다. 실험실로 보이는 한 공간에 검고 긴 책상 3개와 선풍기 3개, 썩어가고 있는 덴티폼 하나가 전부였다. 마음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실로 의연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차팅하기 위한 진단 도구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러나 철저하게 진단하기 시작하셨다. 이내 아이들은 광란적으로 울기 시작했고 나는 고작 구순·구개열을 분류하는 빨간색·파랑색 스티커를 차트에 붙이며 소원했다.
‘다 너희를 위한 거란다. 조금만… 조금만 더… 도와주렴’ 신효근 교수님께서는 그저 웃으셨다.
살아 움직이는 60여명의 교과서를 마주하고 있는 격동적인 순간이다. 20만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Van der Woude 증후군을 가진 언니, 같은 배 속에서 자란, 또 한 번의 20만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여동생이 나란히 내 앞에 서있다. 단순 곱셈도 순간적으로 힘들던(기적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확률이었다. 그들은 정말이지 교과서적으로 양측 구순구개열과 하순의 정중앙에 두 개씩의 누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명하고 노랗던 그 오목한 누공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실로 그 희귀함에 크게 놀라셨던 신효근 교수님의 모습도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바라왔던 것이 한 가지 있다.
미래에 마주할 모든 환자들 우위에 내가 있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나란히 서서 의술을 베풀고 싶다고.
실험실로 보이는 이 좁은 공간에 처음 들어설 때 복도에는 우리를 바라보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있었다. 하염없이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었을 그들은 마치 영웅이 나타나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듯 보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들을 동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위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느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러한 수직적인 마음일랑 버리고 같은 사람이자 친구로서 수평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하기를 다짐해 본다.
#4 아이는 예쁘다
환자를 분류하고 하루에 8명씩의 환자를 배치했다. 이번 해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주었고 병원의 설비들도 완벽에 가까워 기뻤다. 처음으로 수술복을 입었고 수술복을 입혀드렸으며 수술을 보았고 수술에 참여했다.
교과서에서 봐왔던 술식들을 떠올려보면 계속 보고 있기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일어 걱정이 앞섰으나 처음 환아를 마주한 후 처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예쁘다” 였다.
다들 하나같이 억척스레 울면서 수술실에 들어오지만, 작다. 소담스럽고 아담하다. 하얗다. 솜털 같다. 보드랍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무결한 존재 그 자체였고 우리 모두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아이는 예쁘다. 마취 후 눈을 스르르 감는 아이에게 마음으로 전해본다. ‘더 예뻐질꺼야.’
#5 수술 그 후
동그란 눈망울들이 쉴 새 없이 감사를 전한다. 뭐가 그리도 신기한지 졸졸 따라오며 인사를 건넨다. 이러한 기쁨과 설렘으로 바뀐 눈망울이야 말로 우리를 자꾸 이곳으로 오게 하는 원동력이지 싶다.
그래, 그들의 입술은 갈라졌다.
누군가 그랬던가, 사람의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겉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이럴지언정 선물은 선물이다.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 아기는 선물이다. 너무나도 예쁜 선물이다. 그들의 아픈 곳을 바라보며 예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영원하기를 바래본다.
나누리
전북대 치전원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