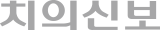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두 주인공의 이름이 주는 은율과 대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삶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복잡한 감정들… 어떨 때에는 갈등이었고, 어떤 순간에는 애틋한 사랑이었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감정이 결국 한 자리에 모여, 더 깊고 고요한 감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심,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은은한 울림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득 저는 또 다른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당연’과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당연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 순간 속에는 종종 감사라는 감정이 조용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멈춰보거나 잃어보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본래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구나.’ 하고요. 당연함의 자리를 감사가 대신할 때, 삶은 전혀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아이와 치과, 그리고 마음… 제가 소아치과 의사로 살아오며 자주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울지 않고 치료받는 아이가 당연한가, 아니면 감사한 순간인가?” 아이에게 치과는 낯설고, 무섭고, 어쩌면 공포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의자에 앉습니다. 작지만 떨리는 입을 열고, 저를 믿고 치료를 견뎌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되뇌입니다. “이 순간이 과연 당연한가?” 아이의 용기, 부모님의 신뢰, 그리고 우리 의료진의 마음이 맞닿는 순간—그곳에는 감사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무서움의 대상이던 치과가 시간이 흐르면 한 아이에게는 ‘용기를 배운 곳’, ‘응원을 받았던 곳’, 그리고 ‘믿음과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선물 같고, 기적과도 같습니다.
2010년부터 15년째 본 병원을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고3입니다. 작년, 제 건강이 좋지 않아 저는 거의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번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고, 오랜만에 반갑게 다시 저를 만났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안 아프실 거죠?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이 젖어올 만큼요. 의사가 환자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흔하지만, 환자가 의사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인연이, 그 진심이 어찌 당연일 수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한 삶에게 저는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오래된 차가 가르쳐 준 교훈도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는 2005년식입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묵묵히 길을 달려준 차지요. 물론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어느 날은 조수석 문이 안 잠기고, 어떤 날은 사이드미러가 외면하듯 접힌 채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순간이 오히려 점점 더 감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허락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삶은 이렇게, 잃어보아야 비로소 깨닫게 하는 순간들을 우리 품에 살며시 놓아두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컵에 손을 베어 오른손을 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늘 너무 당연했던 오른손이 고장 나자, 서툴게 대신해주는 왼손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감사를 잊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래된 차가 또 한 번 말해줍니다. “당연이 아니야. 그러니 감사해.”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다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치과에서도 매일 감사가 피어납니다. 당연히 작동하는 유닛체어, 당연히 돌아가는 핸드피스, 당연히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 주는 환자들, 당연히 치료를 도와주는 팀원들, 그리고 당연히 용기 내어 협조해주는 아이들… 실은 그 어떤 것도 ‘당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허락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치과는 단순히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성장과 감동이 있는 공간, 삶이 깊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도 한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엽니다. 아이가 의외로 울지 않고 치료를 잘 마쳤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한 치료를 완성해내는 팀원들의 환한 미소. 그 모든 순간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삶.” 그것이 제 치과이고, 제 직업이고, 그리고 제 인생이 걸어가고 싶은 길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