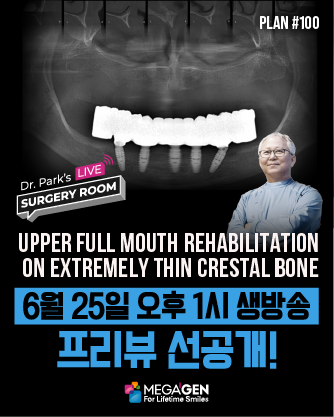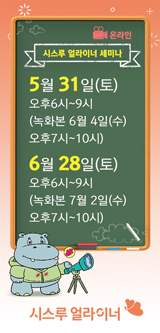김지환 교수의 지상강좌
악간 공간이 협소한 경우 임플란트 수복을 위한 치료 전략 I
연 재 순 서
1. 서론 및 보철적 고려사항
2. 최소 침습법을 통한 악간 공간 확보
3. 교정 치료를 동반한 악간 공간 확보
4. 분절골 절단술을 동반한 악간 공간 확보
I. 서론 및 보철적 고려사항
치아는 인접하거나 대합되는 치아들, 볼과 혀 등의 역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힘의 중립대에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치아는 변화된 새로운 역학적인 관계에 적응해서 새로운 중립대로 움직이게 된다.
치아가 상실되면 대합되지 못하는 치아에서는 정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비어있는 인접한 공간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또한 치아의 회전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치아가 손상 받거나 상실된 후에 적절한 수복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먼저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면서 음식물의 압입과 저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워져서 건강한 치주조직의 유지 또한 위협받게 된다.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로 인해서 교합평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교합평면의 변화는 교합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대한 적절한 보철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수직적인 공간을 침범하게 되어 보철적인 수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임상에서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양상과 빈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보철수복의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 빈도와 양상
1) 정출 빈도와 정출량
치아의 상실에 따른 대합 되는 치아의 정출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바 있다. C raddock 등은 최소 한 개의 대합 되지 않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100명의 환자들의 모형과 대합 되지 않는 치아가 없는 대조군 100명의 모형을 이용하여 대합 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빈도와 양상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교합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있다. 연구결과, 대합 되지 않는 치아의 약 92% 에서 정출이 일어났다. 치아의 정출은 평균 1.68mm 정도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 최대 3.99mm까지 정출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보고들에서는 83%에서 92%까지 대합 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이 일어났다고 한다. 정출량은 24~32% 에서만 2mm를 초과하는 정출이 있었으며, 4~5mm 이상의 정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보철수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모든 경우 즉각적인 공간유지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출양상이나 빈도에 있어서 대합 되지 않는 치아의 위치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Craddock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합 되지 않는 치아가 상악인 경우, 평균 1.91 mm 의 정출이 있었고, 하악인 경우에 1.03mm 의 정출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대합 되지 않는 상악 치아가 하악 치아에 비해서 더 많은 정출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악에서 인접치나 대합치의 상실 시에 흔히 일어나는 것은 상실된 인접부위로 기울지는 것이다. 대합 되지 않는 하악 치아의 정출이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공간유지장치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출양상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양상을 교두의 위치가 정출이 되어 실제적인 정출이 있는 경우를 능동적 맹출 (active eruption)로 구분할 수 있고 잇몸의 퇴축으로 인해 치관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수동적 맹출 (passive eruption)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단계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치아와 잇몸이 함께 정출되고(active eruption) 이후 잇몸의 퇴축이 일어나면서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고 치관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는(passive eruption) 양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능동적 맹출과 수동적 맹출이 동시에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치주건강상태와 관련된다.
또한 주변치아의 마모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출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상대적 마모 (relative wear)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분류에 따라 치료적인 접근이 다를 수 있다. 능동적 맹출만 있는 경우 정출된 치아의 함입과 과성정한 잇몸의 제거를 고려하여야 하고 능동적 맹출 과 수동적 맹출 이 동반된 경우는 치아의 함입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후 치주적인 관리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주변치아들의 마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출된 경우는 수직고경의 증가가 필요한지 평가가 필요하다.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정출로 인해 교합평면이 달라지면, 교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Craddock 등의 연구에 의하면, 대합되지 않는 치아의 53%에서 중심위 또는 측방교합에서 교합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2. 임플란트 보철수복을 위한 수직적인 공간
치아가 상실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보철수복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합치의 정출과 인접치의 움직임이 유발될 수 있다. 상대악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한 수직적 공간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정출된 치아들을 교정적으로 함입하거나 치관의 길이를 줄이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직적인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변연(margin)에서 상대악의 교합면 까지가 6mm 이하인 경우에는 시멘트 유지형 보다는 나사 유지형의 보철물이 추천된다. 임플란트 시스템마다 다양하지만, 지대주 나사의 상부는 임플란트 고정체 상부에서 3-4 mm 정도에 위치한다(그림 3). 따라서 최소한으로 보철물을 제작하면 UCLA type (one piece screw retained crown)으로 치조골에서 4~5 m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폭경 3mm를 고려하고, 이후 잇몸 밖으로 나오는 임상적 치관 길이(clinical crown length)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