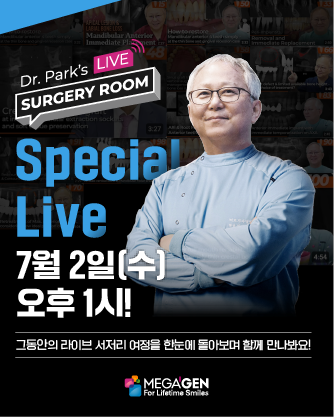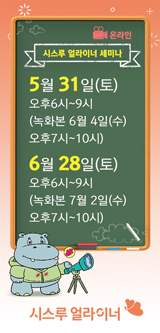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고 등 징계도 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된다.
만약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사직 통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0조 제1·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월 15일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후인 2월 16일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르면 임금을 기간단위(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1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근로제공 의무 다해야
또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먼저 계산하게 된다.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이 값에 30을 곱한 후 총 근로일수에서 365를 나눈 값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K 노무사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대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