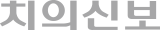혀를 되찾은 민혁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건소로 출근했다. 최 과장은 괜히 소장님 심기만 건드렸다고 짜증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그는 휘파람을 한 번 불어보았다. 혀 보형물이 입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으며 부르르 떨었다. 민혁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구강보건실로 들어갔다.
“얼른 울음 뚝 못 그쳐.
”치과 진료용 의자에 앉은 아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위생사가 아이를 달랬다.
“약을 두 번 바르고 빛을 쪼여주면 끝. 어때 쉽지.”
아이는 엄마와 민혁을 번갈아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아이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린 채 버텼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를 낚아채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이를 꾸짖는 소리가 복도를 사납게 울렸다. 이윽고 아이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민혁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혀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혀 보형물이 부풀며 딱딱하게 경직됐다.
“그렇게 윽박지르면 아이가 조용해지나! 당신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민혁은 속사포처럼 말을 뱉고는 이내 놀라 입을 다물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구멍에서 맴돌던 말을 혀가 밖으로 밀어내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혀끝이 치아에 물렸다.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손님에게 무례해도 되는 거예요. 민원 넣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문을 열고 나가던 아이의 엄마가 민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에게도 신경질을 부렸다.
“넌 뭘 잘했다고 찔찔 짜고 그래. 그만 뚝 못 그쳐.”
민원을 넣겠다는 여자의 말에 위생사는 안절부절못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바람에 벽에 매달려 있던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민혁이 가운을 벗어서 책상에 내팽개쳤다. 침이 배어 나온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졌다.
민혁은 칠순을 맞이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제주여행을 떠났다.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자마자 애월의 한 횟집으로 이동했다. 순영의 아버지가 민혁과 그의 어머니를 점심에 초대한 것이다. 민혁은 호텔을 나서기 전에 혀 보형물을 챙기는 걸 잊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순영이 엄마입니다. 제주도에 잘 오셨습니다.”
순영이 일어나 민혁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칠순이시라면서요. 내려온 김에 구경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잡숫고 즐기다 가세요.”
순영과 민혁의 어머니가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순영의 아버지 하 사장은 탐탁잖은 표정이었다. 그날따라 순영도 웬일인지 말수가 적었다. 민혁 또한 잠을 설친 탓에 갈치구이 정식이 식탁에 차려졌지만 통 입맛이 돌지 않았다. 민혁이 음식을 보고도 반가운 기색이 없자 하 사장이 빈정댔다.
“젊은 사람이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구먼”
그때 민혁의 입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뭐라고요? 제가 입맛이 까다롭다고요!”
순영이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민혁의 혀가 말을 뱉어낸 것이다. 민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영은 화난 아버지와 표정과 굳은 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서 해물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혁의 어머니는 입으로 가져가려던 음식을 도로 접시에 내려놓았다. 민혁이 벌떡 일어나 순영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다.
“야, 일어나. 나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자 순영의 아버지가 민혁을 나무랐다.
“자네 도대체 말투가 왜 그러나? 내가 자네 장인이 될지도 모르잖나.”
하 사장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민혁은 식당 안에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을 깨닫고 입을 다물려 애썼지만 혀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당신이 제 장인어른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시선들이 일제히 민혁에게 꽂혔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제주도 여행은 그것으로 막을 내렸다. 민혁은 갑작스레 오른쪽 가슴 부근의 뻐근한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박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저녁이었다. 민혁은 와인바에서 박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혁이 약속 장소에 들어서자 여종업원이 일행이 있는지 물어본 후 박 교수가 있는 테이블로 곧장 안내했다. 박 교수는 혼자서 와인 한 병을 다 비워가고 있었다. 민혁은 곧바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박 교수의 처분을 바라고 있었다.
“어서 와 앉지.
”민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 교수는 와인 잔을 내밀었다.
“제, 제가 프로, 프로토타입을 연구실에서 허락 없이 가져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사람아 그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딨나.”
그 순간 민혁의 혀 보형물이 제멋대로 작동했다.
“그러게 제가 그때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민혁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불퉁거렸다. 박 교수는 잠시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프로토타입은 착용해보니 어떻든가?”
“그게, 마음속 생각들이 여과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젠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싫은 사람한테 돌직구도 날리고 나름 좋지 않은가?”
박 교수가 견과류가 들어 있는 모차렐라 치즈를 입안에 넣으며 심드렁하니 말했다.
“떼어보려고도 했는데, 한 몸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했다고?”
“네.”
“참 별일이 다 있군.”
와인에 취한 박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지친 얼굴이었다.
“자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허리가 굽으셔서 오래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래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야. 그래도 나처럼 고아 신세는 아니지 않나.”
“……”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임용철 원장
선치과의원
<한맥문학> 단편소설 ‘약속’으로 신인상 등단
대한치과의사문인회 총무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2013 치의신보 올해의 수필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