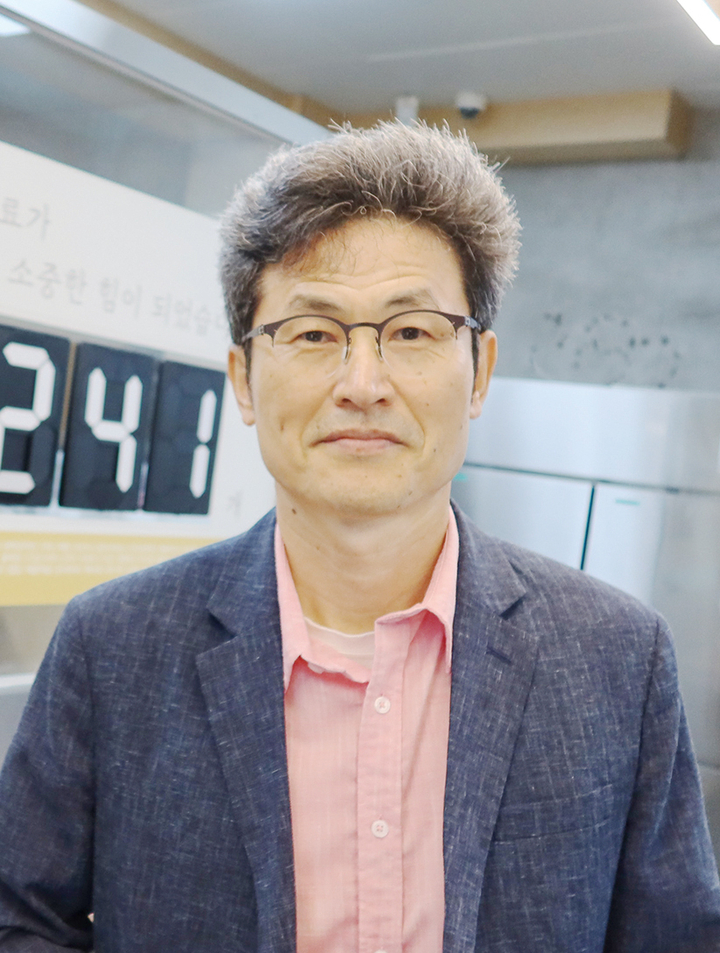
1980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지금의 교육제도와 차이가 컸다. 사교육은 폐지됐고 대학정원이 30% 늘어 변화가 많았으나 감히 누구 하나 입도 뻥긋 못하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도 없었고 학생들은 일찍 귀가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는 ‘교양필독서’라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100여 권을 정리 기재한 8절지(A4용지 두 장) 크기의 목록을 나눠주고 날마다 신문 기사를 읽도록 권유했다.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생각했던 나는 ‘교양필독서’ 목록을 받았을 때 눈이 똥그래졌다. 위인전과 삼국지에 머물렀던 수준인 내게 처음 보는 책 제목과 작가는 위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대학생 형과 누나가 있는 친구 집 책장의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괴테 등 유명작가의 책을 겁 없이 집은 대가로 막막함과 함께 남은 분량을 자꾸 확인하는 버릇마저 생겼고, 읽기는 읽었으나 당최 어려운 내용 탓에 깨우침이라곤 교양인은 참 ‘어려운 길이구나’ 정도였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교양인이 되려고 애썼는데 80년대 초 FM라디오 음악방송이 처음 도입된 덕에 클래식과 가곡, 국악이 연주되는 채널을 듣는 노력이 더해졌다. 대학생이 됐으니 소개팅을 나가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오는 곡의 작곡가 정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게 될 일인가? 연륜이 짧은 나의 교양을 때맞춰 뽐낼 음악이 흘러나오는 일은 없었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인연이 마중 나오듯 허락됐다면 우리의 삶은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는가!
방학이면 세계문학을 붙들고 지속됐던 나의 노력은 80년대 상황에서 교양인을 좌표로 삼기엔 고리타분한 감이 있었다. 이른 아침 신문을 펼치면 최루탄 냄새가 자욱했고 학생과 시민의 함성이 들려왔으며 또 한 장을 넘기면 대열을 이룬 전투경찰의 규칙적인 군화 발소리가 진동하며 들려오던 격동기였기 때문이다. 대학엔 사복경찰이 학생처럼 진주했고 폭력에 무감각해진 사회의 서점가는 사회과학 열기가 뜨거웠고 나의 독서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격동기 사회에서 좋은 학점을 따고 차분한 독서의 평온함을 유지하기엔 젊은 피가 뜨거웠고 대학가 주점 막걸리 앞에 순대와 김치 한 접시를 두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마치 세상 술을 다 마시면 세계평화가 찾아온다는 듯이 술자리를 찾던 때도 있었다. 돌아보면 캠퍼스엔 조용한 학생과 함성이 혼재했고 청춘기 학생들의 발걸음은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느라 분주했다.
세월이 흐르니 유명작가 이름과 중요문장을 외거나 슈베르트의 선율을 가슴에 담아 때맞춰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의 부질없음도 알게 됐다. 개원한 치과의사로 살면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각종 세미나도 쫓아다니며 학회 활동도 해보니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일 또한 간단치 않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수입의 증감과는 별개로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려 열정을 쏟는 치과의사를 보는 일은 마치 경건함이랄까, 지켜보는 이에게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교양인은 도서 목록과 음악회나 미술관 방문 횟수로 규정되지 못한다. 농사만 짓던 시골 촌로의 입에서 자연의 이치를 관통하는 깨달음의 말이 나오듯 삶의 자세가 만들어낸 연륜에는 힘이 있다. 농부는 밭에서 수확물을 얻으며 생활하나 땅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고 비옥하게 가꾸려 애쓴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속에서 수확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교양인이란 제도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보다 자연과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다.
최근 후배가 개원하고 있는 지역에 파격적인 임플란트 가격을 내세우며 건물 전체를 광고로 도배하다시피 공격적 경영 체인이 들어왔다며 걱정했다. 소도시 치과계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쟁 뉴스가 끊이지 않고 트럼프 관세 압박에는 기준도 없는 세상이니 답을 못하고 그저 후배의 말만 들어주는 난감한 하루였다.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교양인은 개인적 삶의 선택이면서도 사회적 동물 인간만이 갖는 문명형성의 독특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