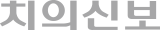버스 차창의 와이퍼가 새똥을 죽 밀어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은 마땅히 할 게 없다. 그렇기에 나는 흥미롭게 창문을 지켜봤다. 버스 기사는 못마땅한지 쯧, 혀 차는 소리를 내고 워셔액으로 똥을 닦아냈다. 금세 창문은 멀끔해졌다.
집에는 얼마 만에 내려가는 것인지 새삼 떠올려보았다. 다섯, 여섯 달만이었다. 본가를 떠나 상경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홀로 떨어져 지내다 보면 집이 너무나도 그리워진다. 기공 실습이라도 있는 날엔 왁스 증기나 석고 가루 따위가 목 안을 빽빽하게 채우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서 얼큰하게 끓여낸 김치찌개가 간절해졌다. 갓 지은 보리밥을 숟가락으로 욱여넣고 국물이 밥알에 쫙 배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치와 고기를 올려 입안 가득 차게 넣으면 케케묵은 먼지들은 단숨에 내려갈 듯싶었다.
고향이 조금씩 낯설어질 때마다 떠밀리는 느낌을 받곤 했다.
언제 한 번은 새벽에 엄마에게, 옛날에 춘천으로 놀러 가서 네 식구가 하나씩 만든 도자기 중 내가 만든 컵이 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몽사몽간에 무슨 컵이지 스스로 되물었다가 문득 길쭉했던 도자기 컵 하나가 생각났다. 오늘은 나가더라도 차조심, 사람조심, 물조심, 불조심하거라. 엄마의 말이 뒤따랐다. 그날은 엄마의 말대로 신호등이 파랗게 빛날 때, 가스버너에 불을 턱 붙일 때,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깨진 컵을 생각하며 조심조심 몸을 움직였다. 그 컵이 어땠더라. 손에 쥐면 어느 정도로 꽉 잡혔더라. 두고 온 강아지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처럼 묘한 기분이었다.
그 후 나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는지 한 번씩 눈여겨 봐두는 버릇이 생겼다. 이번에 이 컵이 새로 생겼다든지,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더 새로 들어왔다든지, 라면을 주로 끓이는 냄비가 새 냄비로 바뀌었다든지. 약간은 낯설고 가벼워진 내 방에 누워 잠을 청할 때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다.
떠나올 때 남긴 것이 사라져간다. 집이 한숨 가벼워진다. 그러면서 낯설어진다.
그 때문에 평소라면 겸연쩍어서 절대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도 쉽게 흘러나왔다.
가족사진 하나 찍어볼까, 하는 내 말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얘가 왜 이러지, 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뜻밖이었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동생 입시 끝나면, 엄마가 대답했다.
또 거실에서 엄마가 멸치를 따고 있으면 나는 옆으로 슬그머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손을 보탰다. 멸치의 머리와 내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비틀어 꺼내고, 배를 살짝 갈라 남은 내장을 긁어냈다. TV가 켜진 거실에 잡다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동안, 스테인리스 볼은 금세 비워졌다. 두 쌍의 손이 함께 움직이니 오늘 다 끝내버리자는 마음이 들었던 걸까. 엄마는 봉지가 하나 더 있다며 부엌으로 갔다. 그마저도 재밌게 해치웠다.
굳이 이 행동의 이유를 찾자면 집에 온 기분을 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 나와 엄마가 머리를 딴 멸치가 매콤한 고추기름에 볶아져 나오자 나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비로소 내가 이 집의 일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이 집에 내 손길이 들어간 멸치볶음이 식탁에 오를 것이다.
뿌리를 다른 흙에 둔 채 옮겨 심어진 모종. 상경해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 모종과 닮아 있었다. 낯선 도시의 흙에 뿌리를 내리려 애쓰지만,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고향의 뿌리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있기 마련이다.
떠밀리지 않기 위해 버티며 조심스레 뿌리를 내려가는, 집을 떠나온 청춘의 삶에 작은 위로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