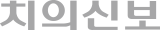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치아 상태가 조금만 양호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처럼 3선을 넘어 종신 대통령을 했을 것이고, 아마 미합중국의 역사가 매우 다른 형태로 전개됐을 것이다.”
조지 워싱턴을 주저앉힌 게 치아 때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실제로 대통령 재직 시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활동 뿐만 아니라 연설을 수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그를 위한 돼지, 소, 엘크뼈 등으로 만든 틀니가 제작됐지만 그는 불편한 틀니를 거부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80세가 넘어서도 누룽지를 씹어 먹을 정도로 건치를 자랑한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치열이 고르고 가지런하다.
조지 워싱턴처럼 치아가 없거나 구강상태가 열악했다면, 당연히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3선까지 다다르지는 못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초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의 의치 제작 기술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최상열 전 국립의료원 치과과장에 따르면, 여사는 사망한 뒤에도 반드시 틀니를 끼워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 ‘조는’ 전두환, ‘덜덜’ 노태우
지난 3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 박준봉) 학술집담회의 연단에 섰던 권 훈 원장(미래아동치과의원)은 ‘대통령에 얽힌 치과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치과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권 원장에 따르면 링컨 대통령(16대)은 치과 치료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33살 때 발치하는 과정에서 악골에 프랙처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대통령이 돼 치과진료를 할 때도 그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흡입하고 혼절하면 자신을 치료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는 게 권 원장의 말이다.
클린턴 대통령(42대)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고향에 있던 치과의사를 찾는 ‘충성파’ 환자였다고 한다.
대통령제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으로 넘어오면 더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양영태 박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치아 마모가 심한 박정희, 치료 중 조는 전두환, 긴장하는 노태우”라는 말로 ‘대통령 환자’들의 특징을 압축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진료에 참여한 적 있는 이병태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치아 상태는 양호했고, 육영수 여사는 더 좋았다”고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11~12대)의 전기인 ‘황강에서 북악까지’에는 소년 전두환의 모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스님이 “댁의 아들이 크게 될 기운이 있는데, 엄마의 뻐드렁니 때문에 기운을 해친다”고 말해 모친이 그 말을 듣고 나무에 세게 부딪혀 이가 부러지게 했다고 한다. 권 훈 원장은 “작가의 상상력일 가능성이 크지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강연 말미에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하는 직업이고, 치과의사는 국민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도록 하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치과의사로서, 모든 국민이 치아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치아를 통해 즐거움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