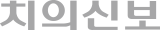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빨강, 빨강 황톳길 저기 저 고개/ 언제나 하늘 붉은 저녁때이면/ 막대 잡은 할머니가 넘어갑니다.”
귀동냥으로 배워 제목도 모르는 노래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가셨을까? 소년은 넘어가 본 적 없는 저 먼 고개 너머가 얼마나 궁금했을까?
김동환 시 김규환 작곡 <남촌>은, 박재란이 <산 넘어 남촌애는>(김동현 곡) 이란 제목으로 다시 불러 가곡과 대중가요가 상생한 드문 경우다. 봄이면 따뜻한 남풍을 실어 오는 산 너머에는 진달래 향기와 보리 냄새를 만드는 ‘꿈의 공작소’가 있기에 하늘빛까지 저리 곱다는 시인…… 시인의 상상력이 파란 하늘보다 더욱 고와서 다투어 곡을 붙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사시사철 왼 종일이 아름답기에, 이 항구는 영원한 세계 3대 미항이다. 그런데 자살자가 끊어지지를 않는다.
드넓은 북미대륙을 가로질러 몇 날 며칠을 달려왔더니, 이제 ‘그 길’은 끝이란다. “Death of the Road!”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나그네는 금문교 난간에 서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다가 끝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다.
미국의 극작가 오닐(Eugene O’Neal, 1888-1953)은 <지평선 넘어>(Beyond the Horizon)로 첫 퓰리처상을 받고(1920) 퓰리처만 네 번, 1936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어렸을 적에는 <지평선>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 데, 조금 더 자라 원작을 읽자 두근거림이 잦아들었다. 대학에 들어가 연극을 보고는 친구들과 그럴듯한 리뷰까지 떠들어댔다. 성장이란 ‘나이 먹기’ 라는 길을 걸으며 조금씩 감성(Sensitivity)을 잃어가는 여정이요, 그래서 ‘앓이(成長痛)’라는 어미가 붙었나 보다. 앓고 잃으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 면역? 성숙? 지혜? 선풍(旋風)에 실리어 오즈를 다녀온 도로시*는 한 눈금 더 성숙해졌고, 내 발로 지평선을 넘어가 본 동생은 주름이 조금 더 늘었다. 돌아온 (round-trip) 무지개와 벗어난(one-way) 지평선은 over와 beyond로 전치사부터 다르다. 전자는 단순한 성숙(growing-up)이고 후자는 깨달음(awakening)인가, 아니면 둘은 애초부터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가?
베스트셀러 중에는 명작이 꽤 있어도 대박 영화 가운데 명화는 드물다. 흥행과 작품성은 전혀 별개로, 과거 B급 취급을 받던 장르(genre)영화들이 블록버스터급 투자에 힘입어 스크린을 독점하는 추세다. 가끔 최고의 명작을 낳았던 서부영화는 마카로니가 망쳤고, 액션물은 무협영화 식 뻥튀기 불사신이 오락게임 수준으로 끌어 내린 지 오래다. 공포-스릴러ㆍ공상-과학 심지어 옛날 만화의 황당한 슈퍼 히어로가 판을 친다. 그나마 충직한 팬들의 조용한 박수 속에 조미료를 안 넣어도 감칠 맛 나는 장르가 바로 로드무비(road movie), 걷는 영화다.
평생 길에서 차력으로 손님을 끌어 장사하며 사는 거친 사나이 잠파노. 돈 몇 푼에 팔려 온 제르소미나는 조금 모자란 제 삶에 가치를 인정해준 ‘바보’가 잠파노에게 맞아 죽자 혼란에 빠져 돌아버린다. 몇 년 뒤 그녀가 미쳐 돌아다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파노는 어두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야수처럼 울부짖는다. 그래도 내일은 다시 고물차에 물건을 싣고 유랑은 계속될 것이다. 로드무비의 원조로서 펠리니 감독의 명작인 영화 <길; La Strada>의 마지막 장면이다.
인생은 로드무비, 나그네 길이란다. 온 데도 갈 데도 모른 채 떠밀려 간다. 곧 끝날 듯 이어지고 영원할 듯 어이없이 끝나는 길. 어차피 서두름과 깨달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값이면 희망을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쉬엄쉬엄 내 발로 걷자. 그 희망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이니스프리에 대한 그리움일지라도…… 수고하고 짐 진 자들은 다 품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 어린이를 위한 동화, The Wonderful World of Oz: Lyman Frank Baum; 1900
 임철중 치협 전 의장
임철중 치협 전 의장
-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후원회장
- 치문회 회원
-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역임
-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 저서 : 영한시집《짝사랑》, 칼럼집《오늘부터 봄》《거품의 미학》《I.O.U》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