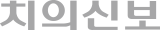병원 내 방 남쪽 창가에는 6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때 여러 지인들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화분 6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다.
병원 내 방 남쪽 창가에는 6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때 여러 지인들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화분 6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다.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주고 받는 그리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수수한 멋쟁이 ‘동양란’ 두 분(盆)이 창가 좌우측 끝 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매끈한 잎이 멋진 ‘안스리움’ 한 분(盆). 또, 아트가위로 정성껏 오린듯한 올록볼록하고 멋스러운 테두리와 은박지를 듬성듬성 덧씌워놓은 듯한 화려한 잎을 자랑하는 ‘수박 필레아’가 가장 널찍한 사각형의 푸르스름한 도자기 화분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가장 조그만 일회용 간이 화분에 이름 모를 이끼류 한 풀이 꿋꿋이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내 창가의 가장 가운데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분홍의 꽃 무늬가 은은히 배어있는 예쁜 타원형 도기에는 올망졸망 자그맣고 앙증스러운 귀여운 잎들을 가진 ‘트리안’과 함께 고상한 척 뒤틀린 모양으로 심드렁히 누워있는 ‘서양란’ 하나가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여섯 식구가 나와 같이 거의 만 6년을 동거동락하고 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원래 병원 한 구석에 정원형식으로 만들어진 빈 공간에서 개원선물로 같이 받았던 높다란 홍콩야자와 우산처럼 커다란 잎이 멋졌던 알로카시아 같은 큰 나무들과 함께 꽤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하지만 환기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를 못해서인지 몰라도 언제부터인지 큰 녀석들이 하나 둘씩 시들어 갔고, 때 마침 병원 내부공사 마저 하게 되어 갈 곳 없는 여섯 친구들이 내 방으로 피난오게 되었다.
내 손으로 식물을 키워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격상 내가 머무는 공간이 너저분하게 되는 게 싫어서 공사만 끝나면 바로 다시 내 놓으려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내 방을 들어설 때마다 블라인드 사이로 살며시 스며드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에 빛나는 초록색 아이들을 마주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묘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숲 속 나무들의 여유로운 향기를 느끼게 해 주듯 싱그러운 초록잎에 반사되는 햇살은 거대한 태양의 안식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주인을 잘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 녀석들이 질긴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는 몰라도 여태 잘 살려서 키우고 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고맙게도 죽지 않고 잘 살아주고 있다.
한편으론 심한 ‘개인주의자’인 나를 만나 이 밀폐된 곳에서 그것도 차들로 가득 찬 6차선 망우대로변의 퍽퍽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내 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다. 영화 올드보이처럼 15년까지는 아니지만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좁은 방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식물이 아닌 다른 살아있는 것들이었다면 아마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라도 주인이 집을 비울라 치면 그 외로움을 못 견뎌 하는 개나 고양이와는 달리 나의 ‘착한’아이들은 간간히 물을 주고 햇빛만 적당히 보여주면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손을 덜 타는 것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실 처음 개원했을 때 선물로 받은 화분들을 보면서 저걸 차라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알지네이트같은 것으로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러던 중 거의 같은 시기지만 나보다 몇 달 일찍 개원한 후배가 있어 병원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다. 여느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눈에 띈 점은 진료실 창가마다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기분 좋은 초록색 식물들이었다. 각종 난과 행운목, 산세베리아, 홍콩야자 등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정성껏 키우고 있었다.
필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그 후배는 마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표정은 사뭇 진지 그 자체였고, 다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에게 이런 말도 했다. ‘이 친구들이 죽으면 나도 병원도 내 인생도 죽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후배의 그 결연한 말과 진지한 얼굴표정이 어찌나 인상 깊었던지 내 심장에 그리고 내 머리속에 선명한 고화질 사진처럼 깊이 박혔다.
박웅현 작가는 ‘책은 도끼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 후배의 그 말과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도끼를 찍어 내듯 깊은 여운과 인상을 새겨 넣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식물을 기르는 일이 보잘 것 없고 하찮을 수도 있을 것인데 진실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커다란 꿈나무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각오로 식물을 키운다면 결코 쉽게 시들게 하거나 죽게 되는 불상사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후배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색종이 팔랑귀를 가진 필자이기에 새로 문을 연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비록 내가 굶을지언정 식물들에게는 때 맞춰 물주기를 거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보살폈다. 그런 덕분인지 지난 6년간 별 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날마다 햇빛을 머금은 초록색 잎을 보며 나의 또 다른 생각쉼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인지는 몰라도 평소 밋밋스러웠던 서양난에서 불현듯 탐스러웠던 ‘그 꽃’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특히 작년 봄 아무도 모르는 작은 소동으로만 끝나 버렸던 아쉬운 미발(未發)의 기억이 있었기에 특히나 더 간절해 하지 않았나 싶다. 이 녀석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소아과 선배의 형수님으로부터 개원식 때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평소 패션감각이 남달랐던 형수님의 안목에 또 다시 감탄하게 만들었던 선물이었는데, 빨간색 도기화분에 싱그러운 초록빛 꼬마 ‘트리안’과 함께 어우러져 우아하게 피어있었던 오페라핑크색의 서양난은 그야말로 한 눈에 반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 6년이 지나 첫 개원 때의 야무진 초심마저 서서히 옅어져 가는 요즘, 창가 햇빛으로 인해 선명했던 붉은색 도기가 연한 핑크빛으로 바래지듯 첫 만남의 두근거림과 설레임도 부옇게 흐려져만 가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은 무심히 기듯 누워있는 ‘나의 서양난’이지만 언젠가는 그 화려한 숨겨진 매력을 다시 뽐낼 때가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본다.
‘조만간 또 꽃이 피겠지?”
주상환
예이랑치과의원 원장